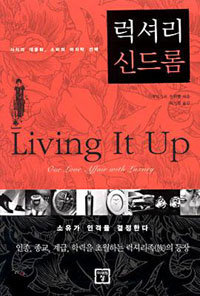
이제는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모습들. 거리에서 구치 핸드백을 든 여성이나 랄프 로렌 셔츠를 입은 젊은이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사람에 앞서 브랜드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다. 이른바 ‘명품족’이 늘어나다 보니 웬만한 고가품은 사치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부자가 많은 것일까.
사실 조니 워커 블루가 아니어도 위스키는 많다. 굳이 카르티에 로고가 없더라도 여간해서 손목시계의 시간이 틀리는 법은 없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은 ‘명품’을 찾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브랜드(제품이 아니라)가 그들을 대변한다고 믿는다.
‘모두를 위한 사치품’은 언뜻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사치품, 또는 호사품을 사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호사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모순된 명제를 충족시킨다. 포르셰 911 승용차를 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물 한잔이라면 에비앙 정도는 마실 수 있다. 된장찌개 백반으로 점심을 때우고 난 뒤라도 후식은 점심값만큼을 지불해야 하는 스타벅스 커피. 브랜드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오늘, ‘일상의 호사품’은 계층의 벽을 허무는 도구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플로리다대 광고학 및 영문학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명품 신드롬을 분석하고 이를 조심스럽게 옹호한다. 누가 호사품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창조하고 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가, 왜 대중은 호사품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검약관, 검소관을 상대로 호사품에 대한 변론을 펼친다.
물론 모든 독자가 “호사품은 민주적이고 결속력이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교육비로 40만달러를 쏟아 부으면서도 이웃의 메르세데스 승용차를 사치라고 비난하는 지식인의 ‘지적 허영’을 들춰내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호사품’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되돌아보게 한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경제경영 >
-

기고
구독
-

이준식의 한시 한 수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경제경영]'칼리 피오리나'…'HP+컴팩'이뤄낸 여걸의 도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2/28/6887659.1.jpg)

![[사설]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013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