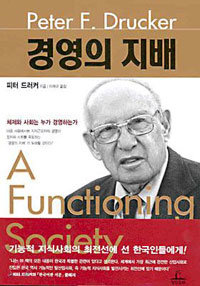
나의 증조할머니는 107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맑으셨다. 옛날 얘기들을 들려주실 때면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던지…. 정규 교육이라고는 전혀 못 받은 할머니의 경험과 얘기들이 그렇게 재미있을진대, 그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또 뛰어난 머리를 지닌 사람이 100년 정도를 살고 들려주는 얘기는?
이 책은 원제가 ‘A Functioning Society’다. ‘기능하는 사회’ 혹은 ‘잘 작동하는 사회’라는 의미인 듯하다. 이 책은 경영 외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커의 해박한 지식과 앞을 보는 능력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서양 사상이나 정치 상황의 변화와 진화 과정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책의 처음 3분의 1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중반을 넘으면서 읽기가 수월해진다. 기업과 경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3분의 1에서 펼친 지식사회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그렇듯이 머리를 끄덕이게 하는 드러커의 최대 강점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논의에서는 노령화, 여성 역할의 확대, 합작과 제휴, 네트워크의 확산 등 일종의 미래학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
문제는 끝까지 ‘기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 사회에서는 지식근로자의 경영이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는 ‘경영의 지배’가 도래할 것이다”는 표지의 글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는데, 그런 해석은 상당한 예비지식과 생각의 깊이가 필요할 것 같다.
감히 한번 유추를 해 보면, 기능하는 사회는 미래지향적 사회다. 그것은 또한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지식을 노동에 적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지식을 지식에 적용’하는 사회다. 미래 사회를 이끄는 것은 덩치만 크고 점점 무능해지며 혁신기능이 없는 정부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기업이야말로 유일한 ‘안정 파괴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옮긴이는 지식경영에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기업조직이 미래 사회의 리더라는 의미에서 ‘경영의 지배’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
드러커가 과거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놓은 이 책은 하나하나 글의 내용들은 물론 훌륭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지만, 하나의 흐름을 얻는 데는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드러커의 100년 가까운 경험과 생각을 경청한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큰 무리는 없겠다.
또한 이 책은 분명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자들과 달리 항상 생산수단을 몸(머리)에 지니고 다니는 지식근로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교육뿐이다. 머릿속에 든 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재산이다”라고 하시던 말을 상기시킨다. 드러커에 맞먹는 그 분들의 지혜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끝으로 “(1969년 당시) 우리 사회의 주요 조직들 가운데 가장 책임 의식이 없는 조직은 기업이 아니라 대학이다”고 한 말이 왜 그렇게 찔리는지. 그리고 나는 교수인데 왜 나 자신이 육체노동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지….
김언수 고려대 교수·경영학 eskim@korea.ac.kr
경제경영 >
-

오늘과 내일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경제경영]'20:21 비전 : 도전받는 평화,의심받는 자본주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4/11/6891567.1.jpg)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4349.15.thumb.jpg)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6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