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는 철도를, 철도는 마을을, 그리고 마을은 사람을, 사람은 강을 따른다. 태어난 순서대로다. 자동차를 모는 이나 기차에 오른 이가 두루 강을 보며 달릴 수 있는 곳. 그곳은 낙동강 최상류의 태백 시다. 가끔 5월에도 간밤 폭설에 갇히고 마는 해발 600m의 청정 고원 태백.
낙동강은 그 태백 산골에서도 백두대간의 마루 금을 잇는 금대봉 아래 산기슭의 너덜 샘에서 솟구쳐 1300리 긴 물을 풀어낸다. 오늘은 그 낙동강을 중류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 발원지인 너덜 샘을 찾아가는 ‘강 따라 물 따라’의 자동차 여행에 도전해 본다. 시작 포인트는 낙동강과 금천, 그리고 내성 천의 세 물이 거의 동시에 한 물로 뒤섞이는 경북 예천군 풍양 면의 삼강 나루(내성 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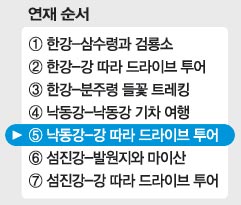 |
● “주모 술좀 주소” 42년전 주막 옛 정취
정확히 1265리(506.17km)의 낙동강. 한 때는 지금의 고속도로처럼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국가의 대동맥이었다. 허나 배는 사라지고 나루는 다리로 대체된 지금, 나루터에는 반드시 있었던 주막 역시 사라진지 오래다. 꼭 하나 있다면 내성천의 삼강 나루에 남은 유옥연 할머니(78)의 주막이다.
삼강 나루는 낙동강의 소금 배며 소발에 짚신 신겨 서울로 몰고 가던 소몰이꾼이 소를 싣고 강을 건너던 곳. 주막은 42년 전 유 할머니가 왔을 때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란다. 변화라면 강의 범람에 대비, 주막 앞에 둑을 쌓는 바람에 강이 보이지 않는 것, 초가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뀐 정도. 쓰러질 듯 기운 이 주막에 혼자 기거하며 42년째 주안상을 내는 것이나 주막 앞마당 강변의 4백 살도 넘는 회화 나무는 예전 모습 그대로다.
주안상이란 특별하다. 맥주 한 병을 시켜도 고추장에 오이 서너 쪽 담은 접시를 쟁반에 받쳐 낸다. 이것이 우리 주막에서 주모가 내는 정성 담긴 주안상이다. 예말고 이런 주안상 받을 곳, 이젠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을 터. 그 주막에서 맥주 한 병 들이 킨 뒤 물돌이 동 의성포를 찾았다. 회룡포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삼강나루에서 멀지 않다.
의성포를 내려다 본 뒤 찾은 곳은 용궁면의 ‘단골 식당’. 맵싹한 청양 고추를 넣고 고추장에 버무린 오징어 불고기가 복더위 방불케 하는 6월 폭염에 지친 심신을 화들짝 일깨운다. 이제부터는 낙동강을 따라 자동차를 타고 태백까지 오르는 북상 길. 풍양에서 913번 지방도를 타고 하회 마을로 간다.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물돌이 동. 전통 양반 마을의 풍모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이다.
 |
하회 마을 근방의 광덕교를 건너면 류성룡 선생의 옥연정사가 나타난다. 부용대는 그 뒷산 마루. 강 건너 하회마을과 그 마을을 휘감고 흐르는 낙동강의 멋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내려다 보인다. 예서 보이지는 않으나 하회 마을 뒤편(강 상류로 6km)의 강변에는 류성룡 선생의 병산서원이 있다. 병산서원은 그 앞에 펼쳐진 넓은 금빛 모래사장과 그 뒤편의 진초록 빛 산하의 대비가 멋진 곳. 옛 선비의 심미안을 읽을 수 있는 절경의 강변이다.
● 1265里 물길따라 하회마을… 도산서원…
여기서 34번 국도로 이어지는 안동. 안동댐에서 잠시 흐름을 멈추고 호수로 변한 낙동강의 풍경을 보겠다면 35번국도 상에 있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예천서 57km 지점)이 최고다. 태백탄광이 한창이던 시절. 강물에 떠내려 온 탄가루가 가라앉는 호수는 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볼썽사나우리만큼 지저분했다. 허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
다음 행선지는 안동호 유입 직전 낙동강이 산자락을 감싸 안는 청량산. 35번 국도로 조금만 더 달리면 만난다. 이 산은 도산서원 근방이 고향인 퇴계가 말년에 자연을 관조하며 즐겨 찾던 곳. 도립공원 입구의 비석에 쓰인 선생의 ‘청량 산가’를 외우며 산을 오른다.
응진전 지나 어풍대(御風臺)에 서니 연꽃처럼 피어난 열두 봉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청량사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절로 가는 길에 들르는 계곡의 숲. 퇴계 선생의 거처였던 오산 당(吾山堂)이 있다. 신라 말 대학자 최치원이 수도(풍열대)하고 신라 명필 김생이 글을 익혔던 곳(김생굴)도 이 근방. 누가 보아도, 언제 찾아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산속 명소다.
예천 안동 봉화=조성하기자summer@donga.com
●사람냄새나는 낙동강 협곡 기차역 마을
 |
낙동강 협곡. 산이 험하고 계곡이 깊어 도저히 도로를 내지 못한, 물살 센 강 상류의 깊은 계곡에 기자가 붙인 이름이다. 그 구간은 청량산 지나 태백을 향해 나란히 사이좋게 북상하던 도로(35번국도)와 강이 결별을 선언하고 제 갈 길로 접어드는 영동선 철도의 현동역(하류·봉화군 소천면), 그리고 ‘하늘도 세평, 꽃밭도 새평’ 의 오지 승부역사이의 16.5km(철로)다. 협곡은 자동차 탄 사람의 접근을 거부한 채 50년 가까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온 오지. 이제부터 그 곳을 찾아가 낙동강 상류의 숨겨진 속살을 더듬어 본다.
협곡 통과 철도(영암선·영주∼철암)의 완공은 전쟁 직후인 1955년 연말. 전 구간(87km)의 23%(20km)가 다리(55개)와 터널(33개)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난공사였는지 알 수 있다. 협곡 구간(남쪽으로부터 현동역∼분천역∼양원 임시 승강장∼승부 역)은 철도를 따르는 도로가 아직도 없다. 철로는 물가의 절벽을 절개해 겨우 확보한 공간에 놓여 있고 때문에 협곡 역은 모두 강가에 있다. 거기서도 최고 오지는 간이역에조차 들지 못해 역사조차도 없는 임시 승강장 ‘양원’. 36번 국도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포장 산길(6km)이 있기는 해도 한겨울에는 통행이 두절돼 한동안 고립된다. 한겨울에 주민(13가구)의 절반이 외지로 나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때 양원의 주민을 외부 세계와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철도다. 하루 네 번 정차하는 통일호가 이곳 주민의 생명 줄이다.
오지의 특성은 인간 간섭이 적다는 것. 양원에서 기자는 해질 녘 박쥐가 나는 모습과 한밤중 산토끼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다. 한낮 길에서는 뱀도 보았다. 철길 아래 강변은 흙길과 수면의 높이가 같다. 철로 변 밭 가운데는 대추나무가 자라고 그 옆에서는 팔십 촌로가 쟁기질하고 송아지가 엄마소의 젖을 빤다. 이런 한가로운 산골 마을의 풍경. 양원에서는 일상이다.
 |
양원 다음 역은 승부. ‘하늘도 세 평, 꽃밭도 세 평’이라는 한 철도원의 멋진 시 구절로 애틋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던 ‘환상선 눈꽃 열차’로 잘 알려진 오지 역이다. 35번국도 변의 석포 역에서 다리를 여러 개 건너 험한 산길로 12km나 가야 만나는 이 곳. 대추나무 드문드문 심긴 고랭지 채소밭이 산비탈을 장식한 협곡 가운데 잇다. 역은 급류의 강 건너 편 바위벽 아래. ‘하늘도 세 평, 꽃밭도 세 평’은 그 절벽 아래에 쓰여 있다.
역과 길을 잇는 것은 출렁다리. 그러나 지난해 여름 태풍 루사 때 휩쓸려 사라진지 오래다. 이후 주민들은 지금까지 철로 위를 20분가량을 걸어 역을 오간다. 2년 전만해도 통일호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은 셋이나 됐다. 그러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며 마을을 떠난 뒤 통학생은 볼 수 없게 됐다. 변한 것이 있다면 통일호만 서는 이 역에 무궁화 호(동대구↔강릉)도 정차(1분간)하기 시작한 것. 사람 만나기 힘든 산골 간이역의 역무원에게는 잘된 일이다. 석포를 나와 태백으로 거슬러 오르는 길. 낙동강 발원지인 너덜 샘이 흘러든 황지천과 철암천이 만나는 합수 점을 지난다. 구문소다. 구문소는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지형이다. 개천 물이 거대한 바위에 구멍이 뚫었기 때문이다. 구문소 터널을 지나면 태백 시내에 들어선다.
시내를 지나 두문동 재에 오르면 중턱과 마루 사이 길가에서 발원지의 석간수를 맛 볼 수 있는 너덜 샘을 만난다. 파이프를 타고 내려온 원류는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진다. 샘이 아니어서 기분은 덜 나지만 물맛은 그만이다. 낙동강 자동차 여행의 끝은 바로 이 상큼한 물맛에 힘입어 더더욱 진가가 돋보인다.
봉화 태백=조성하기자 summer@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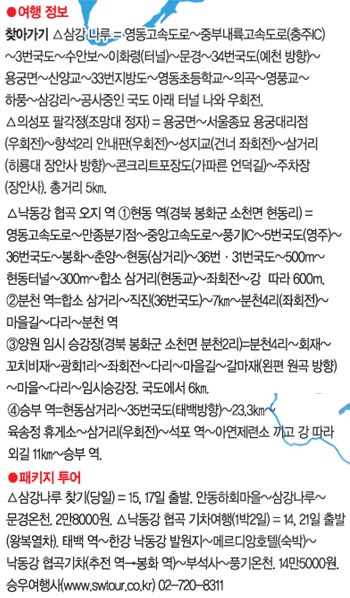 |
코리안 지오그래픽 >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코리안 지오그래픽]섬진강- 발원지와 마이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06/18/689716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