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씨는 윤씨 집에 처음 찾아갈 때 누나가 보내 온 통영 멸치 한 포대를 들고 갔다. 정씨의 누나는 윤씨가 젊은 시절 통영여고에서 음악교사로 있을 때의 제자였다. 정씨가 멸치 포대를 내놓으며 “고향 앞바다에서 잡힌 멸치”라고 설명하자 윤씨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잊었다고 한다. 까마귀도 고향까마귀는 반갑다더니 고향에 못 가던 윤씨에게는 고향 멸치도 무척이나 반가웠던 모양이다. 1994년 윤씨는 귀국 직전까지 왔다가 당국에서 ‘반성문’ 비슷한 각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고향을 찾지 못하고 이듬해 세상을 떴다.
▷통영은 ‘한국의 시드니’라고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운 고장이다. 다도해를 이루는 쪽빛 바다는 물고기가 들여다보일 만큼 맑다. 남녘 통영에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이야기가 들려온다. 73년 납북됐던 어부 김병도씨가 30년 만에 고향 통영에 돌아온 이야기는 코끝이 찡한 사연을 담고 있다. 바다는 옛날 그대로였지만 고향 마을과 가족은 그가 떠날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생후 100일 무렵 헤어졌던 딸은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아버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반기는 가족과 친척의 모습 속에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30년은 기약 없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다. 아내는 재혼한 뒤 병사했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져 고향에 못 가는 실향민이 양쪽에 아직도 수백만명이 생존해 있다. 분단 50년이 넘으면서 고향에 가보지 못한 한을 품고 눈을 감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영국 작가 토머스 하디가 쓴 ‘귀향’이라는 소설도 있지만 귀향처럼 시 소설 영화 가사의 단골 소재가 된 것도 드물다. 우리의 이산가족은 모두 소설이나 영화가 되고도 남을 사연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가뭄에 콩 나듯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 주면서 생색을 낸다. 상봉이라고 하지만 ‘만나자 이별’이니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남북간의 말길, 사람길이 열려 실향민의 귀향이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황호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
횡설수설 >
-

e글e글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장택동]쏟아진 軍 일선 지휘관들의 증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23/13108845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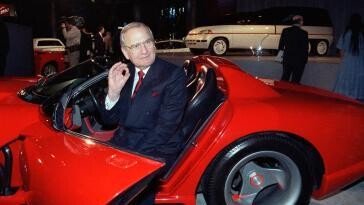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