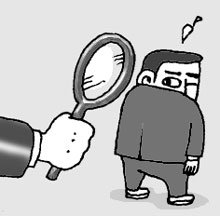
▷남의 잘못을 대신해 죗값을 치른다는 뜻의 ‘속죄양’은 원래 ‘염소를 도망시키던(escape goat)’ 유대 풍습에서 비롯됐다. 16세기 구약성서 번역가였던 윌리엄 틴데일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첫 번째 염소를 잡아 신에게 바치고, 두 번째 염소에게 사람들의 죄를 실어 사막으로 도망시키던 의식을 치렀다고 했다. 사막으로 도망간 염소는 필경 굶어죽었을 터이다. 그와 함께 자신들의 죄도 없어진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었다.
▷동물의 피가 주술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유목민이 아닌 농경사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선행에도 붙이는 ‘희생(犧牲)’이라는 말은 본디 동물과 물품을 신령에게 바치는 종교적 행위에서 비롯된 말이다. 인도차이나의 화전 농경민들은 동물의 피가 작물의 증식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켕은 신성한 것의 제공을 희생의 본질적인 요소로 꼽았다. 속죄양과 희생의 공통점은 대상물의 성화(聖化)다. 그러자면 제물(祭物)이 깨끗해야 한다. 죄 많은 양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요즘 세상에는 자칭 타칭 양들이 하도 많다 보니 속죄양과 죄지은 양을 구분하기 힘들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치만큼 많은 양들이 ‘희생’된 제단도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은 양들이 피를 흘렸는데도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속죄양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찰로도 모자라 특검이 곧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특검이 ‘속죄양’과 ‘속죄해야 하는 양’을 엄정하게 가려주었으면 좋겠다. 이 참에 언론도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가려서 사용했으면 한다. 비유도 자주하다 보면 진실과 착각하게 하니까.
박성희 객원논설위원·이화여대 교수·언론학shpark1@ewha.ac.kr
횡설수설 >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3/14/131211175.2.jpg)

![[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162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