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국 찾은 해외입양아▼
서울 남대문시장 쇼핑, 국립국악원 상설국악공연 관람, 인사동 막걸리 파티…. 나름대로의 조언들이 난무한 끝에 친구는 소시민이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고 싶다며 자신의 일상과 비슷한 일정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들에게 되도록 긍정적인 추억을 많이 남겨 주고픈 욕심도 있지만 조국이 한때 자신을 버렸다는 원망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킬 수 있을지, 홈스테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라 했다.
해외입양아. 우리 사회에서 그에 대해 말하는 일은 불편하다. 그들은 때로 우리보다 더 토종의 순박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인 아닌 외국인이다. ‘생물학적 부모’를 찾기 위해 스무 시간 이상을 비행해 와 닮은꼴의 가족을 찾아 내고도 막상 눈물 말고는 소통할 방법이 없어 서로 부둥켜안고 쩔쩔 매는 낯선 존재다. 미안하고 부끄러워 반갑고 기쁘다는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한 채로 50년이 흘렀다 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해외 입양 50년을 기념하는 2004 세계한인입양대회의 개최 소식을 듣는 일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넘어서 슬프고 저리다.
간신히 가족 상봉에 성공하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버린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펑펑 울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보고싶었다’도 아니고 ‘잊지 않았다’, ‘사랑한다’도 아니다. 새끼를 지켜 내지 못한 어미는 미안할 수밖에 없다. 가난과 불운, 피치 못할 숱한 사정들을 변명할 도리도 없이 그저 약하고 못나서 새끼를 잃어야 했던 스스로를 원망의 표적으로 던진다. 하지만 정말 그뿐인가. ‘모국’, 어머니 나라라는 비유는 국가에 충성 맹세를 바치라고 할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개별자인 국민의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 단위에 개인을 보호할 책임을 모두 떠맡긴 채 여전히 뒷짐을 지고 사후약방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정한 모국을 생각하면 고아의 심정처럼 외롭고 두려워진다.
새삼스러운 민족주의가 아니더라도 한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규모 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인도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 5위의 해외 교민 수를 자랑한다는데 우리 해외 교민들은 철저히 국가의 정책이 아닌 개인의 의지로 온갖 난관을 이겨냈다. 1960년대 이후 자유 이민이 시작되어 지금은 홈쇼핑에서 이민상품을 파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빚과 숙제는 남아 있다. 중국 러시아 등지의 항일독립운동가, 미국(하와이)과 남미의 초기 농업 이주자, 중앙아시아의 강제 이주자, 일본군 위안부, 학도병 징병 등으로 강제동원된 재일교포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의 민족 수난사다.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자명한 교훈은 지금 우리가 해외교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가슴저린 한민족 교민史▼
친구는 작은 집의 안방을 내어 주고 마루에서 불편한 잠을 자면서도 즐거웠다고 한다. 새벽에 함께 동네 뒷산을 올라 약수를 마시고 소망탑에서 기도도 했다. ‘손님’들은 헤어짐이 서운해 맥주를 한 잔 사고 싶다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 2000cc에 해당하는 20200원을 건네주더라고 했다. 그래서 안주는 친구가 샀단다.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소통을 통해 더 넓고 깊게, 우리는 만나야 하고 세계는 확대되어야만 한다.
김별아 소설가
해외입양 : 사설·칼럼 >
-

사설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기자의 눈]유재동/입양을 꺼리는 사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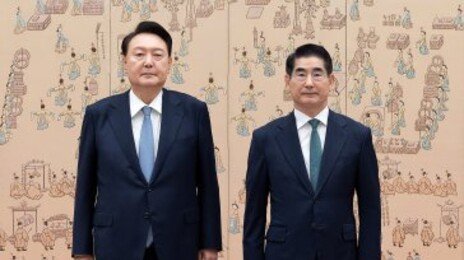
![[김순덕의 도발] 한동훈, ‘내란 수괴’ 탄핵에 정치생명 걸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2262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