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는 넓이 3.3km²에 30여 가구만 사는 조그만 섬이다. 1971년생인 지은이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좀 많은 70여 가구가 살았다. 목포와 연결되는 여객선은 하루 한 번 들어왔지만 변변한 선착장도 없어 그 배가 섬 멀찍이 닻을 내리면 높이 50cm에 길이 5m의 ‘종선’이라는 조그만 배가 사람을 싣고 섬과 여객선 사이를 오갔다.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과 조금 떨어진 곳이다. 지은이는 그 조그만 곳, 종선이 섬과 육지를 잇는 타임머신이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뒤처진 곳의 삶을 행복했다고 기억한다.
물론 가난했다. 할머니를 포함해 여덟 식구가 아버지의 영세한 고기잡이로 살아야 했으니. 당연히 보리쌀이 주식이고 동물성 단백질이라곤 1년에 한 번 잡는 돼지뿐이다. 그나마 배불리 먹은 적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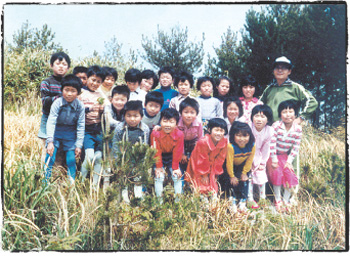 |
그러나 어린 지은이는 가난이란 걸 알 턱이 없다. 가난의 실체를 몰랐기도 했고 고민은 언제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70년대의 섬 생활을 지은이는 비땅(부지깽이)으로 아궁이 속 땔나무를 이리저리 들춰가며 밥을 지으시던 어머니의 부엌으로, 마당 한구석에 묻어 놓은 술항아리 속 밀주로 기억해낸다.
30대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공통의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어디에 살았건 상관없다. 촛불 밑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나면 코밑에 그을음이 거뭇거뭇하던 지은이나, 때만 되면 찾아오는 정전에 초를 찾느라 분주했던 서울 변두리의 독자나, 어머니의 손에 감긴 ‘이태리타월’의 공포는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러나 ‘서울 촌놈’들이 정말 못 당하는 지은이의 유년 쾌락은 바로 주전부리다. ‘자야’나 ‘라면땅’ 정도의 싸구려 과자에 마음을 뺏겼을 도회지 아이들에 비하면 지은이가 늘어놓는 자연의 주전부리는 성찬에 가깝다.
봄의 쟁피(춘란), 보리똥나무 열매, 앵두에 여름의 소라, 참대 낚시로 잡은 운저리(풀망둑). 가을의 고구마, 칡에 겨울의 동백꽃까지. 지은이는 그래서 “초콜릿처럼 달지도, 콜라처럼 톡 쏘지도 않았지만 그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지은이가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답다’는 식으로 유년의 기억을 찬미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얼치기 환경주의자’라고 말하는 지은이는 자신의 아이 지수를 위한 지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지금의 물질적 풍요와 맞바꾼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자연과 하나 되어, 나 스스로도 하나의 자연이 되어 더불어 살았던” 유년 시절에서 멀어진 우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 이상의 걱정이 따라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고서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은 아닐까” 지은이는 걱정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재원도를 떠나 목포에서 유학한 지은이는 유도선수의 꿈을 허리부상으로 접은 뒤 지금은 전남 영광에서 어버이날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오지랖 넓은 집배원으로 천천히 살아가고 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문학예술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동아광장/송인호]](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1753.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