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에 유학하며 문학사에 길이 남을 ‘무정’을 쓰고 있던 춘원은 궁핍하고 병약했다. 어느 날, 각혈로 도쿄 여의전 부속병원을 찾았으나 수중에는 단돈 60전뿐. 진찰을 포기하고 돌아 서려는 그를 허영숙이 잡았다. 나라 잃고 이국땅에서 병을 앓는 조국 청년이 불쌍했기 때문이다.
춘원의 병은 깊어갔다. 또다시 피를 쏟으며 쓰러진 어느 날, 춘원은 놀란 하숙집 주인에게 허영숙을 불러 달라고 했고, 허겁지겁 달려 온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로 생명을 건진다.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연애는 당대 최고의 스캔들이었다. ‘무정’의 인기로 춘원은 스타였고 게다가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다섯 살 연하였던 허영숙은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 의학도였다. 두 사람은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며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이른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은 달랐다. 춘원은 예술가였고 허영숙은 의사였다. 한쪽이 감성인간이었다면 한쪽은 이성인간이었다. 춘원의 내면은 여리고 약했으며 정이 많았다. 속진에 초월해 살았던 무욕의 인간이었으나 생활에서는 ‘빵점 가장’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세상 살아갈 줄 모른다”고 바가지를 긁어댔고, 그리하여 다툼도 잦았다.
그러나 허영숙은 춘원의 생명의 은인이며 주치의이자 간병인이었고, 후견인이자 매니저였다. 암흑의 시대를 예민한 영혼으로 헤쳐 가는 남편이 쓰러지면 밤을 새워 간호했고 옥바라지도 잦았다. 춘원이 친일파로 몰려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 피신시키고 홀로 서울에서 병원을 꾸리며 생활을 책임졌다. 그러면서도 그 시절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피붙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다시 유학 갔던 커리어우먼이었다.
겨우 살 만할 때쯤, 남편의 납북으로 생이별을 했으나 세 남매를 물리학 박사, 영문학자, 생화학자로 키워냈다. 눈 감는 날까지 남편을 그리워하며 “더 착한 아내로 살았어야 했다”고 눈물지었다는 허영숙. 춘원 이광수라는 ‘보이는 남자의 삶’ 뒤에는 시대의 억압을 몸으로 부수며 사랑을 실천한 ‘보이지 않는 한 여성의 삶’이 있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프리미엄뷰
구독
-

기고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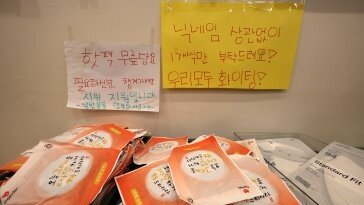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