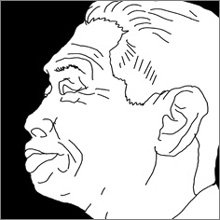
1977년 2월 4일, 자칭 ‘인간 국보(國寶)’이자 ‘소권(笑權·웃을 권리) 옹호론자’인 무애 양주동(无涯 梁柱東)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국문학자이자 수필가였고, 라디오 토크쇼 고정출연자로 전 국민에게 친숙했던 대중적 지식인이었다.
그의 천재성은 자타가 인정했다. 20대에 영문학을 전공해 번역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시인으로서도 문재(文才)를 뽐냈다. 30대에 불현듯 신라 향가를 파고들더니 40세에 불후의 명저 ‘조선고가연구’를 펴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되는 어머니 노래가 그의 시요, 뭇 고교생이 달달 외웠던 ‘찬기파랑가’가 그의 해독이다.
천재성의 바탕에는 천진난만한 학구열이 있었다. 영문법을 독학하다가 ‘3인칭’이란 단어가 막히자 30리를 걸어 읍내 선생님을 찾았더랬다. 설명을 듣고 희열에 들떠 “내가 1인칭, 너는 2인칭, 그 외엔 우수마발(牛수馬勃)이 다 3인칭이니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이야기(수필 ‘면학의 서’)에는 흐뭇한 미소가 깃든다. ‘기하’(幾何·도형과 공간을 연구하는 수학부문)의 한자를 뜻풀이하면 ‘몇 어찌’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감했다는 회고(수필 ‘몇 어찌’)에서는 똘망똘망 눈망울을 굴리는 학동이 떠오른다.
그 천진난만함은 웃음과 한몸이다. 부의금 챙기기에 여념이 없던 상주(喪主)가 틈만 나면 ‘유장한 베이스’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더란다.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 상가에서 껄껄 웃다가 쫓겨났다는 일화(수필 ‘웃음설’)는 가히 블랙코미디다.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이 ‘100년 뒤 남을 한 권의 책’이라고 극찬했던 그의 ‘조선고가연구’도 이제는 후학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저승의 양 박사는 과연 노여워하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후학들의 꿈에 나타나 “그래, 너는 국보 2호 해라”라며 껄껄 웃는 것이 그의 풍모에 걸맞다.
김준석 기자 kjs359@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서영아의 100세 카페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길에서 눈 마주치면 ‘저 사람도…’ 피해자는 두렵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8418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