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하여 1982년 3월 18일 ‘예외적인 시대에는 예외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며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문화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애꿎은 또래 대학생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 발생 14일 만에 자수한 그에게 이듬해 3월 8일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다.
문부식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고 사형에서 감형된 6년 9개월 옥살이 동안 억울해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죄의식에 시달렸다.
“그것(방화)밖에는 방법이 없었을까? 내가 가진 정의를 실현하려 하기 전에 그로 인해 다치고 죽게 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고민했다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살인’을 고발하려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 역설적 상황 앞에서 문부식은 절망하고 회의했다.
출옥 후 그는 달라졌다. 학생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국가 권력의 폭력과 야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안의 파시즘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로는 비굴했고 도망쳤던 상처, 기억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끝없이 회의하고 갈등했다.
친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변절자’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이 돌아왔다. 그러나 가장 괴로웠던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자신이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배교(背敎)적 상황이었다.
‘소위 전향한 사람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일에는 나름대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배교가 순교(殉敎)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귀한 일일 수 있다.’(소설 ‘비명을 찾아서’ 중)
어느 인터뷰에선가 ‘운동’이 뭐냐는 질문에 “별 게 아니다. 그건 옆에서 누가 맞고 있는데 모른 척 지나가기엔 마음이 찔리는 것이고 옆에서 누가 굶고 있는데 혼자 먹기가 찔리는 것, 그래서 에라, 좀 덜 먹어도 나눠 먹고 맞더라도 같이 맞자는 결단”이라고 말한 문부식. 그가 말하는 성찰은 ‘정직’의 다른 이름이었다. 사태의 근본까지 파고들어가 그것들과 솔직하게 대면하는 일 말이다. 성찰은 고통스럽지만, 에둘러 가는 비용을 막을 수 있으므로 실용적이다. 성찰과 반성은 없고 주의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시절에, ‘착한 남자 문부식’의 말이 주는 울림이 크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횡설수설
구독 276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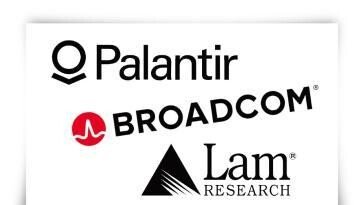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