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사자(死者)’ 조창호(趙昌浩) 소위는 1994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중앙병원 입원실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뇌중풍의 후유증으로 발음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는 ‘꿈만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연세대 교육학과 입학 직후 6·25전쟁이 터지자 네 달 만에 국군 장교로 자원입대했다.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다가 후퇴하던 중 부상한 부하를 구하려다 북한군에 잡히고 말았다. 탈출하려다 다시 붙잡혀 노동교화 수용소에 갇혔다.
1964년 수용소를 나온 뒤 13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다. 국군에 포로가 됐다가 귀환한 인민군 출신 처녀와 결혼해 아들 둘도 낳았다. 규폐증에 걸려 탄광 일을 면한 뒤에는 자식들이 몰래 일군 화전(火田)으로 연명했다.
1992년 성신여대 총무과의 한 직원은 겉봉에 ‘대한민국 성신여자대학 조창숙’이라고 쓰인 편지를 받았다. 수소문 끝에 성신여고 가정과 교사로 재직했던 조 씨의 누나 창숙 씨를 찾아냈다. 편지는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조선족이 조창호 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부친 것이었다.
은밀한 서신이 오간 뒤 1994년 10월 3일 새벽 그는 뗏목으로 압록강을 건넜다. 중국에서 어선을 타고 공해로 나온 그는 23일에야 조국의 흙을 밟았다.
그 뒤 11년, 조 씨를 시작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탈북 국군 포로는 40여 명에 이른다. 정부가 파악한 북한 생존 국군 포로만 540여 명. 휴전 후 납북된 민간인도 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귀환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2000년 당시 통일부 장관은 ‘포로 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귀환한 그해 중위로 예편한 조 씨는 올해 2월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6·25 참전 국군포로 가족모임 발족식’에 명예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이북에서도 천대와 서러움을 받았던 국군포로 자녀들이 여기 와서까지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온전히 삶을 바친 구성원을 그 국가가 불행하게 만든다면, 또는 그 불행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국가일까.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책갈피속의 오늘 >
-

광화문에서
구독
-

2030세상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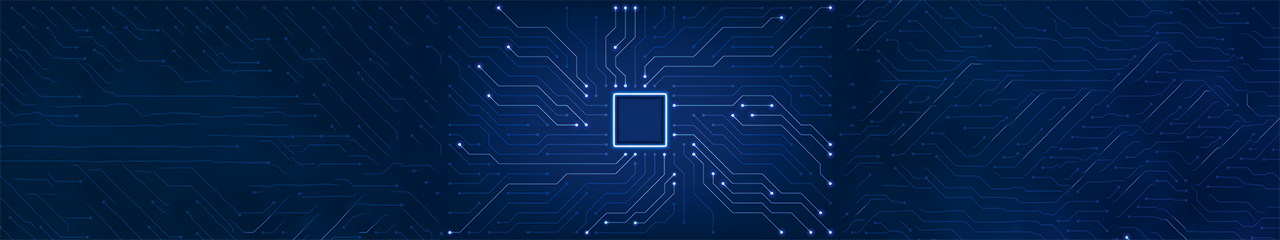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창간특집]책갈피 속의 4월 1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