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탈북자 출신 서울시민이다. 탈북자 단체를 이끌면서, 북한을 겨냥한 자유북한방송을 시작하면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서 살해 위협을 비롯한 온갖 협박에 시달리며 지냈다. 밖에서 조심하는 것은 물론 귀가한 뒤에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소리를 죽이고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왔다.
남한 체류 7년은 44년의 세월을 살아온 그에게 긴 시간은 아니다. 그래도 그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고 싶다. 이웃 주민에게 “우리 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소”라고 ‘광고’하는 삶이 시작된 올해를, 그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그를 변하게 한 사람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4월 28일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사진을 찍었다. 북한군 대위였던 그가 ‘탈북→체포→강제 송환→탈출’로 이어진 탈북 과정을 설명하자 “용감하다”며 팔을 뻗어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특유의 제스처로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일을 추진 중이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중국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10만 탈북자’에게 새 길이 열렸다는 확신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미 정부가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의 망명을 허용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로 입증됐다.
그의 고민은 한국과 미국이 점점 다른 나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탈북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역시 만나지 못했다.
미국이 오히려 그를 반긴다. 지난해 11차례나 미국을 방문해 의원들을 만났다. 하원 청문회에도 3번 참석했다. 올해도 벌써 2번째 미국을 다녀왔다.
그가 2004년 4월에 시작한 자유북한방송과 2005년 12월 첫 전파를 보낸 대북단파방송에 대한 관심도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한다. 몇몇 개인과 기독교 단체의 성금이 젖줄이다. 반면 미국 쪽에선 의회가 감독하는 기금이 5월부터 연간 5만 달러의 지원을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성원을 보내고 있다.
그의 삶처럼 탈북자 전체에 큰 변화가 닥쳤다. 한 해 한국 입국자가 많아야 수백 명이던 2001년까지를 1기, 1년 입국자 1000명을 넘어선 2002년 이후를 2기라고 한다면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올해는 3기의 시작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들을 수용하면 탈북자의 운명은 크게 달라진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사이에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환경이 좋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한국에 가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리지만 미 공관에 진입하면 훨씬 빨리 자유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탈북자들을 설레게 한다.
그는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더 많은 탈북자의 자유세계 정착을 위해 열심히 양국을 오갈 계획이다. 자신이 한국의 무관심과 미국의 적극 개입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다는 생각도 한다. 그래도 “명분만 있으면 1조2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들었을 때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북한 정권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는 한국 정부가 왜 탈북자에게는 그토록 인색한가. 200만∼300만 원이면 탈북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는 ‘조국의 품으로 귀순하는 탈북자’는 끊어지고 ‘낯선 나라 미국으로 망명하는 탈북자’만 줄을 서는 날이 올 것 같아 두렵다.
방형남 편집국 부국장 hnbhang@donga.com
오늘과 내일 >
-

기고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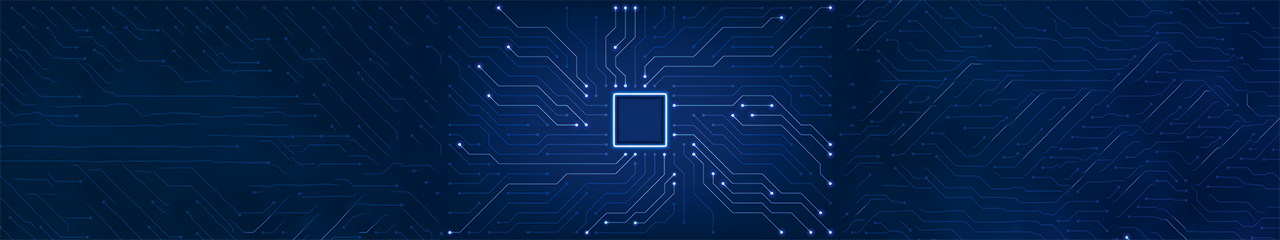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DBR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김윤종]아이가 숨진 후에야 법을 만드는 나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4/131036282.1.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