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은 아직도 재일교포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열린 사회라고 주장하기는 민망하다. 순혈(純血)주의를 내세워 외국인을 차별하기로는 세계에서 한국만 한 나라도 없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82만여 명이라고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울산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신고된 국제결혼은 모두 4만3121건으로 서울에서만 1만1507명이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았다. 농어촌 지역에서 장가간 총각의 36%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외국 여성과 결혼했다.
외국인이 아니면 산업체가 돌아가지 않고, 가정도 꾸리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동화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피부색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탓이다.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하인스 워드가 최근 두 차례 한국을 다녀간 뒤의 일이 아닌가.
한국의 배타적 민족주의, 폐쇄적 외국인관(觀)은 단군 이래 단일민족의 혈통을 이어 왔다는 신화(神話)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입증할 수 없는 얘기다. 정도의 문제일 뿐 주변국들과의 전쟁과 교류를 통해 타(他)민족의 피가 섞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한국의 민족주의 개념도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에 태동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독립신문(1896년 4월 7일∼1899년 12월 4일)엔 ‘조선인민’이라는 말은 나와도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국민들 사이에 민족적 정체성(正體性)이란 개념은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침략 등 숱한 역사적 굴곡이 아니었다면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보다는 개방적이었을 것 같다. 과거엔 외환(外患) 극복을 위해 ‘방어적 민족주의’로 사회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국가 간 장벽이 점차 사라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지역감정으로 갈리고 탈북자, 중국동포조차 포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피부색, 혈통에 구애받지 말고 국적(國籍)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으로 결속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국민이 되기를 원했고, 되어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이민족과 ‘민족끼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스스로를 ‘김일성 민족’으로 부르는 북한 정권의 추종자들 중 어느 쪽이 더 동질감을 주는가.
‘하이브리드(hybrid·혼혈, 혼성)’는 미국 중국 등 다민족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민족은 민족주의 학설을 체계화한 베네딕트 앤더슨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의 말처럼 ‘상상의 공동체’일지 모른다.
한기흥 논설위원 eligius@donga.com
광화문에서 >
-

횡설수설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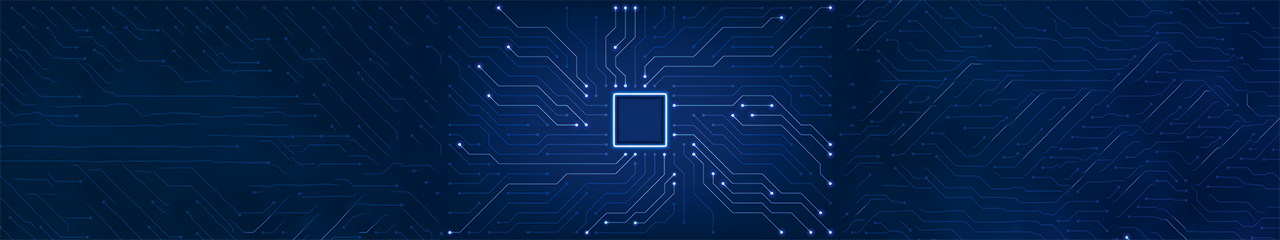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재명]알파고 쇼크 이후 9년… 잘하는 것부터 해보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7/131049722.1.png)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4984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