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도자가 되기엔 전공(戰功)이 부족했던 그는 동방의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다 대패해 살해됐다. 크라수스가 이끄는 4만 명의 로마군이 패했던 기원전 53년부터 300년 가까이 파르티아는 고대 서방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로마에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전성기인 로마제국에 파르티아가 직접 도전해서? 물론 아니었다. 오리엔트의 강국이었던 파르티아는 인접국 아르메니아를 탐냈다. 문제는 아르메니아가 로마제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였다는 점.
파르티아가 아르메니아를 침탈하면 로마는 거의 매번 개입했다. 제국 동쪽 변방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게 사가(史家)들의 해석이다. 아르메니아가 무너지면 다시 인접국이 동요하고 결국 제국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로마는 아르메니아로 진격해 파르티아 세력을 내쫓고, 파르티아 영토를 점령하기도 했다. 그래도 파르티아를 복속시키지는 않았다(로마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한 파르티아는 226년 사산조 페르시아에 멸망한다). 파르티아에 대한 관심보단 아르메니아의 동요를 막는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가 그렇듯, 아르메니아에는 로마파와 파르티아파가 갈렸다. 평소에는 로마파가 득세했지만 파르티아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파르티아파의 세상이 됐다. 그러다가 멀리 서쪽에서 로마군단의 흙먼지가 피어오르면 다시 로마파가 권력을 잡았다.
로마와 파르티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고대 정치 역학관계가 떠오른 것은 현대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의 말 때문이었다. 체니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향해 진군하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생포한 직후 리비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체니 부통령의 말은 ‘이라크전쟁 무용론’에 대한 반박이지만 세계를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 아래 두려는 제국의 눈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로마가 파르티아를 때려 아르메니아를 ‘팍스 로마나’ 아래 두었듯이 미국은 이라크를 때려 리비아 같은 나라에 본보기를 보여 주려 했을 수 있다. 고대나 현대나 제국의 속성은 같은 게 아닐까. 공교롭게도 옛 파르티아 땅은 미국에 대든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다.
이어지는 체니 부통령의 말은 더 의미심장하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 방안도 탁자 위에서 치우지 않았다”며 군사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도 한미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비확산(non-proliferation)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하지만 그 군사행동은 ‘동맹파’와 ‘자주파’로 갈려 흔들리는 동맹 한국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도 담고 있을 것이다. 그 옛날, 로마파와 파르티아파로 갈린 아르메니아에 로마가 그러했듯이….
박제균 정치부 차장 phark@donga.com
광화문에서 >
-

정일천의 정보전과 스파이
구독
-

사설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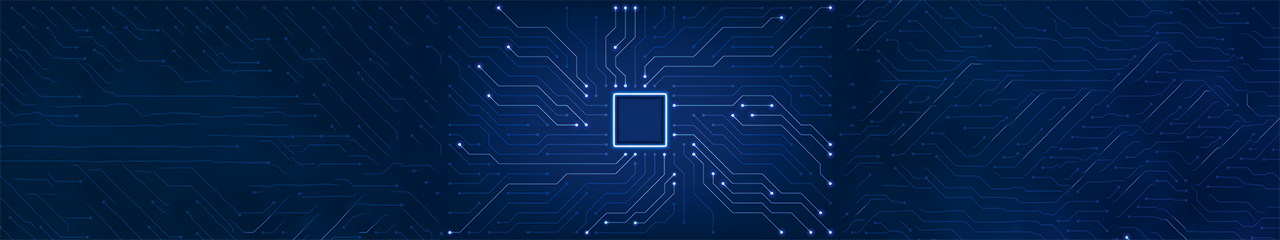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김호경]공사비가 쏘아 올린 ‘재건축 로또’ 시대의 종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6/131042049.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