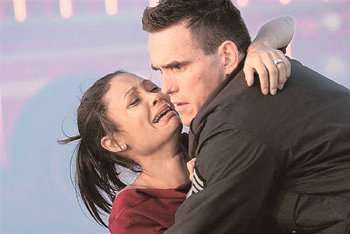
2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79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주요 후보작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더 퀸’과 음향상 등 2개 부문에 오른 ‘아버지의 깃발’은 상영 중이며 7개 후보에 오른 ‘바벨’과 8개 후보에 오른 ‘드림걸즈’는 22일, 남우주연상 후보 ‘행복을 찾아서’는 3월 1일 개봉한다.
한국 영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카데미상 수상은 화제의 중심이 됐고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칸 효과’나 ‘베니스 효과’는 없어도 ‘아카데미 효과’는 분명 존재했던 것. 그러나 최근 들어 후보작이나 수상작들의 흥행 성적은 시원치 않은 편. ‘더 퀸’과 ‘아버지의 깃발’은 19일 현재 각각 4만4000명, 15만 명이 들었다.
지난해에도 작품상 수상작인 ‘크래쉬’는 15만 명의 관객이 들었고 감독상 ‘브로크백 마운틴’은 34만 명, 남우주연상 ‘카포티’는 6900명, 여우주연상 ‘앙코르’는 21만 명에 그쳤다.
물론 2000년 이후에도 흥행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작품상을 수상한 ‘반지의 제왕-왕의 귀환’(2004년)은 596만 명, ‘글래디에이터’(2001년)는 266만 명이 봤다. 그러나 둘 다 상의 후광이 아니라도 흥행했을 만한 블록버스터들인 데다 아카데미 시상식 훨씬 이전에 개봉해 ‘아카데미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감동적인 드라마인 ‘뷰티풀 마인드’(2002년)와 뮤지컬 영화 ‘시카고’(2003년) 등이 100만∼120만 관객이 들었다. 2000년의 ‘아메리칸 뷰티’는 66만 관객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상명대 영화과 조희문 교수는 “미국 영화가 블록버스터와 비주류 예술 영화로 양극화되는 가운데 아카데미가 상업적, 미국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예술성에 치우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수상작의 질은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진지하고 지루해 관객의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의 남윤숙 이사는 “개봉 영화가 적었을 때는 아카데미상이 선택의 기준이 됐지만 요즘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화를 선택하는 비율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지영 기자 yourcat@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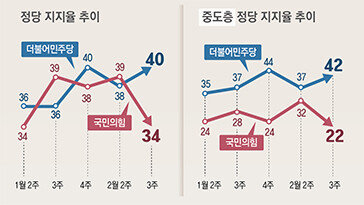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