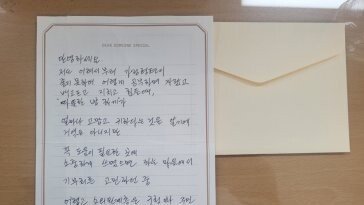민주공화국은 곧 ‘민주주의+공화주의’ 국가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가를 천명한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공화주의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면 대개 고개를 갸우뚱한다. 헌법 교과서에서도 그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화국을 나타내는 영어의 republic은 원래 ‘공적(公的)인’이라는 뜻의 public에서 나왔다. 즉 공화주의는 공공(公共)의 이익, 공공선(善), 공공성(性)의 가치가 핵심이다(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사회비평’ 2007년 겨울호 ‘공공성의 붕괴인가, 공공성의 미발달인가’).
헌법 규정 곳곳에 녹아 있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위대가 바로 공직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권력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적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그들은 당선 또는 임용되는 순간부터 공적 존재가 된다.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이야기를 통해 공적 존재의 의미를 풍자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그의 어머니는 공개된 상태에서 그를 출산했고, 그 후 그의 모든 생활은 수행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국사(國事)뿐만 아니라 식사, 취침, 기상, 착의(着衣), 대소변도 그랬다. 목욕과 정사(情事)도 거의 공개적이었다. 공개리에 사망했고, 시체는 공개적으로 잘게 토막 내 ‘존귀한 인사들’에게 배분됐다.
국가원수의 생활에도 공사(公私) 구분이 있는 현대국가에서 공적 존재의 의미를 이처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공적 사안에 관한 한 사(私)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제1조 1항의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야 정당들의 공천심사를 둘러싼 아귀다툼을 보아 왔듯이 그들이 공적 존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원로 변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매일 공천 관련 뉴스를 쏟아냈지만 과연 공천(公薦)인지 사천(私薦)인지 국민은 헷갈린다.
굵직굵직한 다선(多選)과 고령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키며 ‘개혁 공천’ 시늉도 경쟁적으로 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개혁’인지, ‘학살’이나 ‘계파 나눠먹기’인지는 불분명하다. 국민 눈에는 사냥개들이 먹이로 붙잡은 동물을 서로 많이 뜯어먹으려고 아우성치면서 남의 입에 들어가는 살점까지도 빼앗아 먹는 동물의 세계로 보일 뿐이다. 공천의 이면에 국민을 속이는 어떤 음모나 술수가 숨어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심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실력자나 탈락자나 자기 변명식의 사적(私的) 발언만을 뻔뻔스럽게 내뱉는다. 그들은 딴 세상 사람들이다. 그러니 공천극(劇)을 묵묵히 지켜본 국민은 감동이 없고 그저 어지러울 뿐이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