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핏 ‘짝퉁 영어’ 같은 이 단어들은 실제 터키에서 쓰이는 말이다. 터키의 국부(國父)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1881∼1938)는 1928년 아랍문자 사용을 폐지하고 로마자로 터키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독립과 건국, 근대화의 아버지 격. 우리로 치면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세종대왕 이미지까지 겹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아타튀르크에 대한 터키인들의 존경은 절대적이다. 오죽하면 생전에 국회로부터 ‘아타튀르크(터키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았을까. 터키 국토 전역에는 아타튀르크의 이름을 딴 각종 시설과 동상, 기념관과 기념물이 널려 있다.
프랑스 파리 중심의 개선문이 서 있는 광장의 이름은 샤를 드골. 웬만한 중소도시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드골을 기리는 광장이나 거리가 있다. 수많은 위인을 배출한 프랑스지만, 존경하는 인물 조사에서는 항상 드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아타튀르크와 드골은 전쟁(1,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나라를 구하고, 근·현대화의 기틀을 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비롯해 근대화의 틀을 세운 메이지(明治) 유신의 영웅들이 존경받는 인물의 상위에 오른다.
우리에겐 누가 있을까?
본보가 3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정치지도자’(56.0%)로 꼽혔다. ‘정치 발전(56.4%)과 경제 발전(78.2%)에 가장 기여한 정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단연 ‘박정희 정부’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아타튀르크나 드골처럼 국민적 추앙을 받지는 못한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던 드골과 달리 장기집권을 꾀하다 온 국민의 비탄 속에 조용히 영면한 아타튀르크와도 달리 비명에 떠났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독립과 건국 지도자에게 국민적 존경을 보내는 것도 아니다. 지도자의 흠결보다는 국가 발전에의 기여를 크게 보는 긍정적인 시각의 결여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근·현대화의 진정한 영웅이 없는 사회,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만든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하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노무현 정부 식의 ‘권위 부수기’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을 했다면 부당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라는 기막힌 궤변, 오로지 ‘세상이 몰락하기를 바라며’ 파괴를 일삼는 배트맨의 조커 식 혼돈이 자란다. 낮에는 동화작가이자 속독학원장이었다가 밤에는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두 얼굴의 조커들이 자생한다.
내년이면 벌써 박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 국민 과반수가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30년이 되도록 기념관을 짓는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다가오는 추석, 귀성 귀경길에 좌우로 스쳐가는 푸른 산하를 보라. 한 번이라도 어린 시절의 붉은 민둥산을 떠올린다면, 그가 푸른 국토를 물려준 것 하나만으로도 기념관을 헌정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박제균 영상뉴스팀장 phark@donga.com
차승재 >
-

유윤종의 클래식感
구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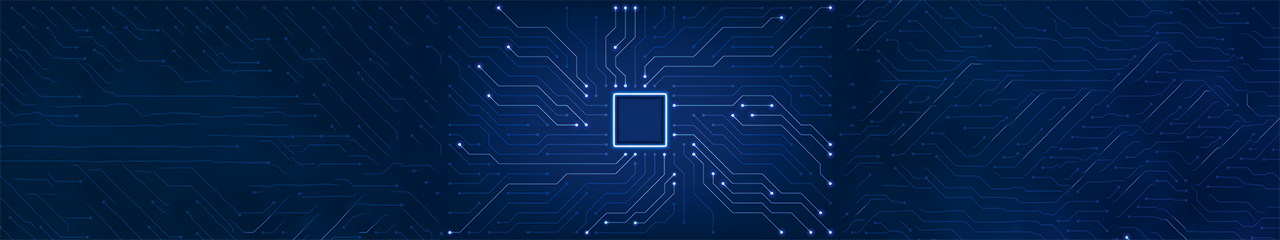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