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수도권에 비해 기업할 여건이 나쁜 지방의 산업기반과 도로 철도망을 보강하려는 정책이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이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지방을 더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지방도 수도권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를 스스로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기업 관련 규제와 땅값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 지방 입지가 유리한 점도 많다. 정부는 공장 설립이 쉽도록 4대 강 인근의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용지 공급 규모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찌운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어느 지방이나 경쟁력을 키울 여지는 있다. 자력으로 살길을 찾는 자구(自救) 노력을 게을리 하고 중앙정부에 손만 벌리려 해서는 지자체 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권역별로 지정된 선도산업의 성공 여부는 광역경제권 전략의 성패와 직결된다. 해당 지역의 산업 입지와 기업 유치 전망을 감안해 결정했겠지만,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성이나 자체 발전 구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도산업은 권역별로 1∼3개씩 지정돼 모두 20개에 육박한다. 한 가지 산업이라도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함 직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역권 개발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서 (나중에) 여기에 상응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선후(先後)를 따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도 풀 수 있는 것은 서둘러 풀어나가야 한다. 억지로 수도권의 발목을 잡다 보면 국가의 전체 파이를 줄이게 된다.
화제의 비디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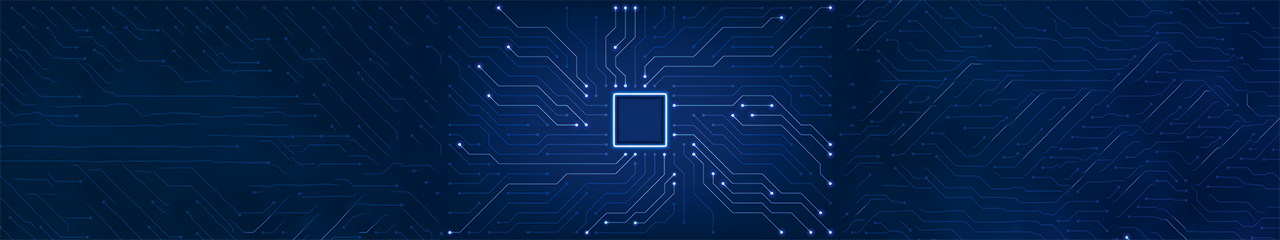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