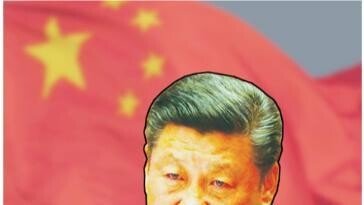별정직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다른 부처에서는 드물다. 인권위의 일반직 전환은 2006년 안경환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05년 12월 공무원시험령이 개정돼 각 부처의 ‘자율 특채’가 허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인권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 특채가 많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조기 정착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시민단체에서 몇 년 일하면 인권문제 전문성이 저절로 생기는가.
인권위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은 전체 직원의 약 20%에 이른다.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김칠준 사무총장도 참여연대 간부 출신이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경력 5년 이상이면 5급으로, 15년 이상이면 3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공무원은 7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15년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다.
시민단체 출신이 많다 보니 인권문제를 보는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2004년 직원들이 반대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지난해 인권위의 결론은 인권위원들이 내린 것이지만 조사를 맡은 직원들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정원의 30%가량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의 업무량과 비교해볼 때 인권위 인력을 30%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인권위는 법에 따른 독립적 국가기구임을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코드 특채와 파행 인사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자율성 독립성만 내세우는 것은 ‘끼리끼리 이기주의’로 비친다.
화제의 비디오 >
-

오늘과 내일
구독
-

사설
구독
-

동아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