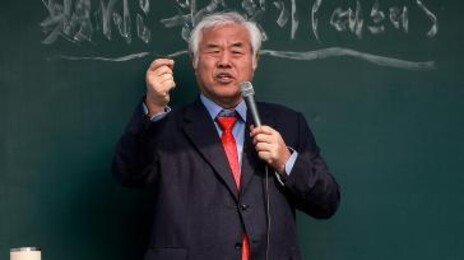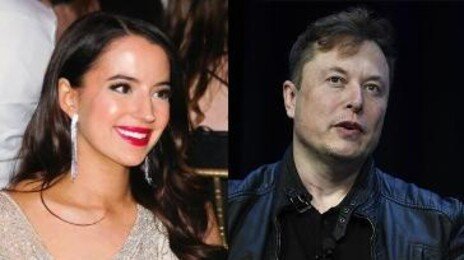달리며 충전하는 전기자동차
이 방식의 가장 큰 장벽은 1km에 2억 원씩 드는 전력공급선 설치비용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는 운전 가능 도로 6만 km의 20%인 1만2000km에 왕복 1차로씩 전선을 설치해야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4조8000억 원이 든다.
전력공급선이 깔려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이 차는 배터리 힘으로 달려야 한다. 하지만 배터리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배터리 크기가 5분의 1이면 충분하다. 전기자동차는 가격의 3분의 2가 배터리 값이기 때문에 생산비도 싸져 휘발유차와 비슷하다.
예를 들어 아반떼급 승용차의 휘발유차는 1500만 원, 배터리형은 3000만 원, 휘발유와 배터리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는 3500만 원인 데 비해 온라인 충전 방식은 1400만 원이면 생산이 가능하다. 에너지 비용은 놀랄 만큼 싸다. 휘발유차가 연간 200만 원 든다면 하이브리드 78만 원, 온라인 40만 원, 배터리형은 38만 원 수준. 그러나 배터리형은 200∼300km 달리면 한참 쉬면서 재충전해야 해 실용화가 힘들다.
전국에서 100만 대의 차량이 10년간 운행된다고 치자. ‘인프라 구축비용+차량 생산비+연료비’를 합한 총비용을 비교하면 휘발유차가 35조 원, 하이브리드가 39조 원, 온라인은 21조 원쯤 든다. 간선도로만 달리는 버스나 트럭은 이 기준보다 전력공급선을 훨씬 덜 깔아도 문제가 없다. 따지고 보면 온라인은 차량 밀도가 높아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전기자동차가 조만간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비용이 싼 차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뿐이다. 온라인 충전 자동차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올 1월 선정해 보고한 ‘17개 신성장동력’의 한 예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8600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 중 온라인 충전 자동차엔 250억 원이 배정돼 있다. 온라인 차량도 그렇지만 신성장동력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원천기술을 확보해 세계특허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미국은 이번에 7870억 달러의 추경을 통과시키고 그중 15%를 R&D에 할당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추세다. 이에 비해 우리의 R&D 예산 8600억 원은 전체 추경 규모 29조 원의 3% 수준에 그친다. 충분치 않은 비율이다.
미래 외면하는 추경예산은 안 돼
문제는 이마저도 “추경은 당장의 위기 극복에 투입돼야 한다”는 교조적 문제 제기에 걸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 ‘당장의 상처’를 보듬는 데 최우선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침체에서 벗어날 때 재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기술개발이 지연되고 마침내 특허마저 빼앗긴다면 참 낭패스러운 일이다.
공공경제학은 이렇게 가르친다. ‘높은 과학기술 수준은 튼튼한 안보, 치안, 공정한 법치, 투명성, 시장경제, 민주주의, 도로, 항만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이자 사회적 자본이다. 이 같은 공공재의 구축은 정부와 재정이 존재하는 기본 이유의 하나다’라고.
허승호 편집국 부국장 tigera@donga.com
씨네@메일 >
-

횡설수설
구독
-

인터뷰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