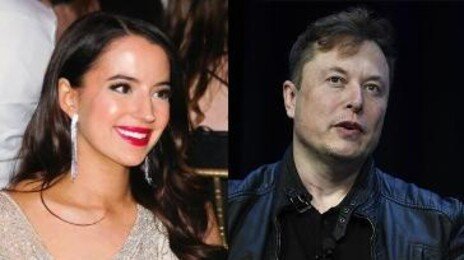다문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단지 외국인들의 물리적인 이민, 이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문화심리학자 존 베리가 강조했듯이 이주자들 스스로 새로운 사회 문화에 적응 및 순응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주자들도 새로운 나라에 무조건 동화되기보다는 모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화에 통합되는 편이 정체감의 갈등 없이 적응에 성공하는 길이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모국 문화를 얼마나 유지하면서 우리 문화에 흡수되고 있는 것일까.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이주 여성의 엄청난 증가이다.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에서 이주해오는 이들은 고국에서 가난하게 생활했던 경우가 많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선 알 필요 없다, 한국문화만 받아들이라’고 강요받는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는 자녀 양육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모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가정이 많다. 또 한글을 잘 몰라 양육정보를 공유하고 싶어도 쉽게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한다. 자녀가 학교를 다녀도 알림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숙제에 대해 물어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학교 적응이 어려워지고 결국 진학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기보다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게 한다. 앞으로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례해 우리 사회에 많은 낙오자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교육이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TV를 접하게 된다. 엄마의 한국어가 서툰 상황에서 TV는 엄마를 대신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게 해주는 그럴듯한 도구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의 결정적 언어습득 시기를 고려할 때 TV 시청은 초기 언어발달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국 워싱턴대 드미트리 크리스타키스 교수는 2개월에서 48개월 된 아이들에게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작은 수신기가 달린 조끼를 입혀서 언어발달을 연구했다. 잠자고 씻는 상황을 제외하고 12∼16시간 수신기에 기록된 것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시간 TV를 틀어놓을 경우, 어른에게서 직접 듣는 것보다 500∼1000개나 적은 수의 단어를 들었다. 또 아기가 내는 발성 횟수나 시간, 대화도 급격히 감소했다. TV 시청으로 인해 엄마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로 하여금 언어발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프레드릭 지머먼 교수는 275개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아이가 나타내는 모든 행동을 기록했다. 그 결과 아이는 하루 평균 1만3000여 개의 단어를 듣고, 400단어를 사용해 어른과 대화했다. 이처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직접 대화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효과적이다. 어른이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아이가 아직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아이와 대화하는 것이 언어발달에 있어 약 6배나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 언어발달에서 서로의 직접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발달을 위해서도 엄마와의 언어적 대화는 중요하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자신과 2세의 적응을 위해서 시급하다.
모국 문화 유지하도록 포용해야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한국어 습득만을 강조하면서 그들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저버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적응을 가져오지 않는다.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자들 스스로 모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여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열려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곽금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교수·심리학 kjkwak@snu.ac.kr
영화 프리뷰 >
-

횡설수설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프리뷰]‘주홍글씨’…충격적인 21세기판 창세기 3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10/20/693139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