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예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을 앞질러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국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회사 비야디는 한 번 충전으로 400km를 달리는 전기자동차를 세계 경쟁기업의 절반 가격에 생산해내며, 1만 명이 넘는 기술진으로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다. 작년 매출의 75%를 해외에서 올린 세계 2위 통신설비 제조업체 화웨이, ‘중국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하이얼, 중국 최대 태양광패널 제조업체 상더전력 등은 각각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2007년 연구개발 투자액은 488억 달러였는데 우리는 2008년 313억 달러였다. 중국은 이제 값싼 저질품을 만드는 짝퉁 천국이 아니다.
재작년에 나온 IBM컨설팅 한국보고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앞둔 한국 경제가 20년째 GDP 순위 11위권에 정체돼 있다’며 혁신의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선진국을 모방하는 전략으로는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진단이었다. 더구나 2010년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작년 GDP 순위에서 15위로 밀렸으며 중국에 쫓겨 허둥지둥하는 신세다. 기술에 대한 행정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다.
기술규제는 전기 통신 에너지 같은 전문 분야와 연관된 탓에 그동안 해제나 완화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지식경제부가 기술규제에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중복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차이테크(China-tech)는 약진하고, 코리테크(Korea-tech)는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예상이 가능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6/13051144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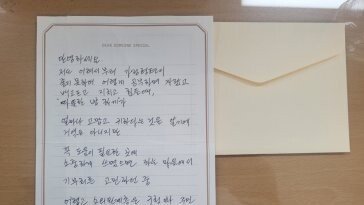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11483.1.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