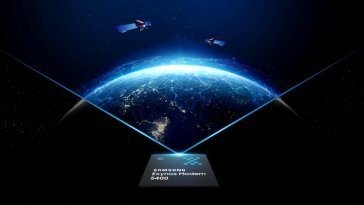“글쎄요. 가치와 명품이라고 할까요?”
광양 동계훈련지에서 만난 성남 신태용(40) 감독은 올 시즌 목표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축구 팬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의미였다. 사령탑 데뷔 첫 해 K리그와 FA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였기에, ‘우승’이란 답을 예상했기에 조금 의외였다. 평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그였다.
물론 성적에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젊음과 내일이 있기 때문에 금세 잊을 수 있었다. 아직 정식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성남 구단은 감독 대행 꼬리표를 뗀 신 감독에게 최소 2∼3년 간 지휘봉을 맡기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은 좋지 않다. 성남을 대표했던 풍족한 재정도, 호화 진용도 옛날 얘기다. 국내 경기는 풀렸다지만 예산 삭감의 폭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김정우, 이호 등 주축 여럿이 떠난 반면 영입은 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굵직한 대어들을 영입하는 타 구단을 보며 부러움마저 느꼈다. 현재로선 6강도 어렵다는 평가가 대세다. 실제로 성남 구단도 벤치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는다. 신 감독은 고위층으로부터 “꼭 잡을 것만 잡자”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는 놓치고 싶지 않다. K리그와 FA컵 등도 마찬가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목표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면 그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괜한 자신감이 아니다. 스스로에 10점 만점에 9점을 매긴 한 시즌을 보내며 나름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선수들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 맏형 리더십은 올해도 통할 수 있다고 본다.
광양|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