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내내 찾고 잃고 고민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미워한 것. 그래도 어쨌든 건축이었다. 게으르고 아둔하고 물러터진 탓으로 한번 택한 길을 다 가지 못한 채 전혀 다른 길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두 해 전 초겨울. 일민미술관에서 정기용 교수를 테마로 한 기획전이 열렸다. 스케치와 글, 소장품으로 빼곡한 전시물 사이에 정재은 감독이 스토리를 엮었다는 3분 길이의 애니메이션이 반복해서 플레이되고 있었다. 그 기억의 배경이 낯설고 허하고 쓸쓸했던 것은, 혼자만의 착각이려니.
한 해를 더 거슬러 올라간 햇살 포근했던 겨울날. 정 교수의 삼청동 작업실에 앉아 등허리로 받는 볕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헛소리 비슷한 어설픈 질문을 잇달아 드렸다. 차근차근 타이르듯 답을 풀어내 주셨던 그분이 얼핏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무엇을 쓸 수 있을지.
무엇이든, 써도 될지.
국화 밭에 파묻힌 듯했던 영정에 절하고 잠깐 멀거니 섰다가 종종걸음으로 도망쳐 나왔던 봄날 밤의 기억이, 반복해서 플레이됐다. 한 해 전인데 가장 먼 기억이다. 바람이 찼다.

‘건축’을 표제로 내건 영화 두 편이 나란히 극장에 걸려 있는, 묘한 풍경의 시기다.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지하건물 속 극장에서 숙제하듯 ‘말하는 건축가’를 보고 나온 날. 내친 김에 다른 영화도 야간 유료시사로 털어내듯 봐버렸다. 기차역을 괴물 같은 미로로 뒤엎어버린 백화점 속 극장에서.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고 싶지 않다. 굳이 꾸역꾸역 그것까지 보고 앉아있는 나 자신의 미련함이 상영시간 내내 원망스러웠다.
‘말하는 건축가’는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한 권의 단출한 노트로 읽혔다.
이 땅에 언제나 존재했지만 이 땅의 누구나에게 언제나 생경하게 여겨지는, 건축이라는 야릇한 외곽의 대상. 그것을 평생 업(業)으로 붙들고 살다 간 어떤 이의 이야기를 열심히 받아 적은, 노트.
‘건축에 대한 노트’는 당연히 아니며, 그렇다고 한 특정 건축가에 대해서만 폐쇄적으로 기록을 제한한 노트도 아니다. 이 땅 위 사람들이 건축을 대하고 소비하는 무도한 보편적 방식에 대해서, 뷰파인더 뒤의 누군가가 조금씩 깨쳐가며 써낸 노트 같았다.
정 교수는 ‘좋은 건축가’였을까. 몇몇 건축가와 비평가가 등장해 각자의 의견을 들려준다. 평가라기보다는 인연의 소회에 가까운 말도 있다. 당연히, 또 다행스럽게, 의견의 향방은 제각각이다.
도망자이며 중도탈락자인 나는 거기에 감히 어떤 말도 덧댈 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자신이 땀 흘려 일한 덕에 누군가 편안해하는 것을 보며 행복해 하는 사람. 그런 이는 아마 ‘좋은 사람’의 테두리 안에 당연히 들어갈 거다.
그런 마음씀씀이는 건축에만 한정될 리 없다. 인터뷰 내내, 마감에 쫓긴 어설프고 무지한 질문에 고민 다한 배려를 풍성히 얹은 답이 돌아왔다. 묵직한 인터뷰이가 겸허하고 솔직한 답을 안겨줄 때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늘 나 자신의 무능함이다. 진땀 흘리며 주워 담듯 받아 적고 나온 길의 뿌듯했던 기억이 선연하다.
차를 달려 정읍 기적의 도서관에 닿았던 날. 지붕에 달팽이 조형을 얹은 외관의 첫인상은 많이 난감했다. 책 읽는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 사진을 찍으며 두 시간쯤 보내고 나니, 그 난감함이 내 얄팍함 탓임을 알 수 있었다.
들어가 쓰는 이보다 구경하고 소유하는 이를 배려하는 공간에 익숙해진 채 굳어버린, 시각과 가치관의 얄팍함.
이 영화가 보는 이의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피사체의 인품 덕일 것이다. 쿠션 두툼하고, 고집 센 인품이다.
그런데 그걸로 좋은 걸까.

중반부. 지방도시 공공시설물 건축 작업에 얽힌 모멸과 비탄을 짚던 이야기의 초점이 묘하게 ‘동대문’으로 점프한다.
이 부분 이후에 대한 관객의 해석과 반응이 궁금했다. 여러 갈래로 벌어질 수 있을지.
감독이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의 방향은 또렷하다.
그런데 그것이, 정 교수가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의 흐름과 같을까. 또는, 동대문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정 교수는 적절한 투사체일까.
동대문 프로젝트 꼼뻬에 참여했던 건축가들과 그 과정을 지켜본 비평가들의 코멘트가 엮어진다.
이 부분에서 정 교수는 희미하다. 오래 전 관공서 프로젝트 작업 때 VCR에 담은 코멘트가 대체재처럼 삽입된다.
저래도 될까.
정답이 있는 공간이 있을 리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치 정답이 ‘있었다’는 듯, 영화는 이야기한다. 비약이며 무리수다.
감독은 혹시, 좋은 피사체는 찾았으나 ‘영화’를 엮기 위한 스토리 덩어리를 얻지 못해 고민했던 것 아닐지.
동대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하디드 아주머니가 던져낸 주물럭 UFO 조형물은 구태의연하다. 그녀의 전작들에 비해 이미지가 섹시하지 않다. 이미지의 섹시함이 그 건축가가 쌓아 온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 결함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반드시 동대문 프로젝트에 불합리하기만 한 선택이었는지.
나는 그에 대해 답할 자격이 없다.
건물은 완공 전이다. 어쨌거나 이왕 지어지고 있다. 되도록 아무 탈 없이 본래 의도대로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재미나게 그 공간을 이용하기를, 나는 희망한다. 때늦은 비판 때문에 칙칙한 절망으로 그 커다란 공간이 태생부터 비틀리지 않길 기원한다.
감히, 정 교수 역시 그렇게 바라셨으리라, 버릇없이, 되짚어 기대한다.
누군가 시사회에서 질문 서두에 “고맙다”고 이야기했다는 전언을 들었다.
누가, 왜, 이 영화로 인해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동대문을 다룬 중반부는 버거운 사족으로 보였다.
너무 큰 모자. 품이 헐렁한 양복 윗도리.
그분의 생전 맵시에 어울리지 않는다.

작품 기획전 진행 과정과 임종을 그린 뒤 생전 한때 모습을 짤막하게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는다.
머리와 말미. 거기서 중반부보다 더 넉넉한 이야기가 보였다.
초등학교 때 마루에 엎어져 읽은 동화책. 지은 지 수십 년 된 한옥을 찾아온 백발의 목수가 집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더니 필요한 부분을 보수해준 뒤 표표히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들어가 머물고 움직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찾아 물어 들은 뒤 그것을 기초 삼아 공간을 구성하고, 다 지어진 뒤에는 부족함 없이 잘 쓰이고 있는지 슬며시 찾아와 살피는 건축가가, 동화 밖에 실재했으며, 실재한다는 것.
응당 할 일을 틈 없이 행하려는 과정에서 지금 이 땅의 건축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싸움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엿보도록 해 준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불이 켜지기 전에 극장을 도망쳐 나왔다.
그 암담한 울컥함이 그저 내 마음 좁음과 경험 없음 탓이길, 부끄럽게 소망한다.
명품 가방이나 구두를 쇼핑하듯 이름난 외국 건축가들의 자폐적 프로젝트를 뭉텅뭉텅 사재기해 이 땅 곳곳에 진열하는 창피스런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시장바닥에서 콩나물 사듯 설계비 깎아대 놓고 “내 아이디어가 이 집의 콘셉트가 됐다”느니, “실제 기본 설계는 다 내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느니 떠벌리는, 건축주들의 무례한 흰소리가 조금이라도 잦아들길.
꽃밭을 꾸밀지 빙판을 깔지 슬로프를 세울지 해마다 철마다 고민해야 하는 서글픈 광장이, 다시는 출현하지 않길.
무력하게 기원한다.
외곽의 대상이 한 뼘쯤이라도 중심으로 다가들어, 조금이나마 다른 존중과 이해의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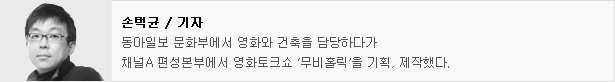
※ 오·감·만·족 O₂플러스는 동아일보가 만드는 대중문화 전문 웹진입니다. 동아닷컴에서 만나는 오·감·만·족 O₂플러스!(news.donga.com/O2) 스마트폰 앱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