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1980년생 작가의 재기발랄 상상력… 미드를 읽는 맛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그들에게 린디합을
손보미 지음/267쪽·1만1000원·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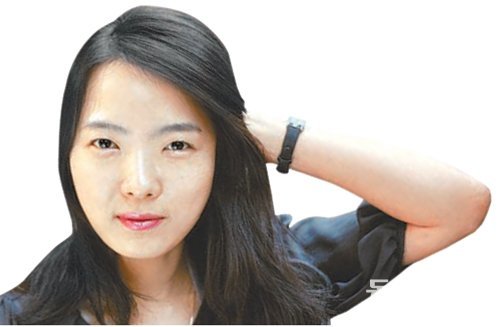

작품의 배치부터 다중우주 이론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느껴진다. 모두 9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이 소설집은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수상작 ‘담요’로 시작해 지난해 문학잡지에 발표된 ‘애드벌룬’으로 끝난다. 흥미로운 점은 ‘담요’에서 콘서트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주인공의 아들이 ‘애드벌룬’에서는 멀쩡히 콘서트장을 빠져나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것. 두 작품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를 간섭하되 독립적인 하나의 우주 역할을 한다.
추리소설과 미국드라마, SF소설 등 다양한 장르물의 세례를 받은 이 1980년생 작가의 또 다른 스타일은 작품 속 공간에서 시대성이나 공간성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번역투 문장의 의도적인 구사나 외국인 인물의 잦은 등장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작가는 시대성과 공간성을 거세한 공간 위에 인물들을 마치 틀린 철자법처럼 배치하고는 이들 사이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어긋남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통속적인 연애물의 외투를 걸친 작품에서조차 작가는 독자가 궁금해 할 오해와 의심의 실체를 밝히는 데 무관심하다. 대신 이 때문에 신음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조명해 ‘이런 신음이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 아니겠느냐’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스타일을 극단으로 밀어붙여 희소성을 확보한 것은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지만, 서사나 위안에 무심한 소설에 냉담했던 독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남아 있는 숙제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문학예술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DBR
구독
-

천광암 칼럼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트렌드뉴스
-
1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2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3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4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6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7
국힘 공관위 출발부터 삐걱…‘李 변호인 이력’ 황수림 자진사퇴
-
8
與 “尹키즈 시도지사 8명 퇴출” 野 “부동산-관세 경제실정 부각”
-
9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 사실무근…명예훼손 고발할 것”
-
10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3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4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5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6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7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8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트렌드뉴스
-
1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2
조희대 “與,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국민에 직접 피해”
-
3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4
1만명 뒤엉킨 日 ‘알몸 축제’ 사고 속출…3명 의식불명
-
5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6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7
국힘 공관위 출발부터 삐걱…‘李 변호인 이력’ 황수림 자진사퇴
-
8
與 “尹키즈 시도지사 8명 퇴출” 野 “부동산-관세 경제실정 부각”
-
9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 사실무근…명예훼손 고발할 것”
-
10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1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2
119 구급차 출동 36%가 ‘허탕’… “심정지 대응 10분씩 늦어져”
-
3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4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5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6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7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8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