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기자가 본 현장]
아픈 바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전남 목포에서 진도까지는 40여 km. 승용차로 빨리 가면 40분 정도 걸리지만 길은 천리 길 같았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고교 동창들에게서 친구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22일.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 동창생은 기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워낙 경황이 없었던 데다 졸업한 후 20년 넘게 만나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으로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가족대책본부로부터 ‘시신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짐을 챙겨 떠난 터였다. 그는 문자메시지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이 ‘134번’이라고 알려왔다.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한동안 그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어머니, 사망자 현황 게시판 앞에서 행여 자녀 이름이 오를까 숨죽인 채 지켜보는 아버지…. 내 자식만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 온 이들 앞에서 친구를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항구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신원확인소’(임시 안치소)에 있었다.
“아이들을 봤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내가 아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친구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다. “아내는 (아들이) 맞다고 빨리 (안산으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혹시 시신이 바뀔지 몰라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이 징한 바다를 보고 싶지 않지만 통보가 늦어지니 어쩌겠느냐”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믿고 여행을 가다가 죽었잖아. 그럼 누구 하나 뺨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이냐고…”라며 울부짖었다.
진도=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기자의 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성장판 닫힌 제조업 생태계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2/10/130602757.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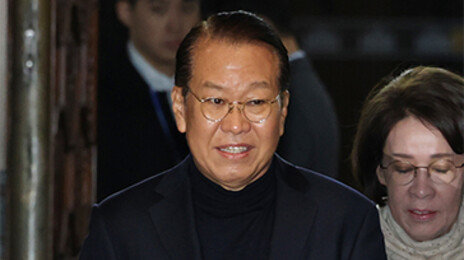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