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동아스마트금융박람회]전문가들 “위로부터의 혁신 필요”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비(非)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금융과 비금융의 무너진 경계 안에서 금융회사들은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김용아 매킨지&컴퍼니 시니어 파트너)
‘2014 동아스마트금융박람회’의 특별강연에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은 낙후된 한국의 금융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이런 기회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한국 스타트업만 고군분투”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표해 강연자로 나선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척박한 한국의 핀테크 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국NFC는 올 3월 모바일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스마트폰 뒷면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사업자 인증이나 보안성 심의 등의 창업 과정이 복잡해 8개월째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 황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이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황 대표는 또 각종 규제로 한국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간편한 결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많게는 22단계까지 거쳐야 한다”며 “복잡한 결제 과정 탓에 결제 도중 쇼핑을 포기하는 이용자가 30%에 이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한국은 스타트업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은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등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시대에 맞지 않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해외는 선진국뿐 아니라 금융 기반이 낙후된 신흥국에서도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 속도가 눈부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영국은 런던 테크시티가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뒤 에든버러, 버밍엄, 맨체스터 등 다른 도시로 핀테크의 물결이 번지고 있다. 핀테크 투자를 통해 이 3개 도시에서 한 해 생긴 일자리만 약 17만 개에 이른다. 윤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고사 위기에 빠지자 정부가 나서서 핀테크를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삼고 처절한 변화와 개혁을 이끈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 알리바바는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부터 알리페이에 충전한 여윳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 온라인 펀드 ‘위어바오’, 전자상거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액대출까지 금융과 IT를 융합한 ‘완벽한 생태계’를 이뤘다. 윤 원장은 “규제를 완화해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적극 허용한 덕분”이라며 “한국에서는 ‘금산분리’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파트너는 “오히려 금융 인프라가 많지 않은 신흥국에서 모바일, 디지털 금융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이를 눈여겨보고 사업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파트너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디지털뱅킹 등을 만들 때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 방안으로 삼고 경쟁자가 될 구글, 애플 등 비금융회사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하지만 이것도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도 규제만 극복하면 해외 업체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좋은 핀테크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최고경영자(CEO) 및 기관장
△강원 우리카드 사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 △김주하 농협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원급
△고형석 하나SK카드 최고정보책임자(CIO) △공웅식 외환은행 CIO △구원회 미래에셋증권 스마트Biz부문 대표 △김병철 대신증권 CIO(전무) △김영윤 KB금융지주 전무 △박영배 신한카드 신사업본부장 △백인기 국민은행 부행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성재모 삼성카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시석중 기업은행 부행장 △신승진 농협은행 CIO △심재승 코스콤 전무 △이재정 신한카드 부사장 △전대근 코스콤 전무 △정용호 KDB산업은행 부행장 △정환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본부장 △조완우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장 △한준성 하나금융지주 CIO
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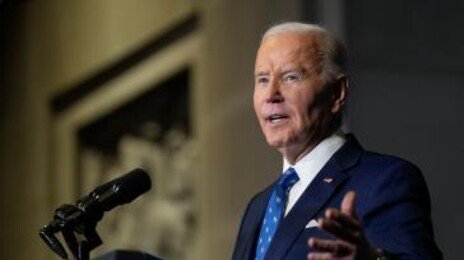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