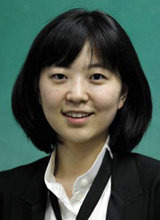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수병이 서해에 잠든 뒤였다. 당시 사회부 사건팀 기자 중심이던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취재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심경을 들어 46명 전원에 대한 ‘오비추어리(부고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필자도 특별취재팀의 일원이었다.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과정은 마음을 아무리 단단히 먹어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다. 그들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 형제였기 때문이다.
천안함 취재를 끝낸 뒤 우리의 관심은 2002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방한계선(NLL) 경계 순찰에 나섰다가 북한과의 교전 끝에 6인의 용사가 숨졌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당시와 달리 국민적인 추모는 없었고 언론도 그들을 크게 조명하지 않았다. 사건팀 기자들은 이들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기로 계획을 세우고 희생 장병들의 가족을 만났다.
조 중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갓 100일이 지난 아기를 안고 있었던 아내도 만났다. 남편의 3일장을 치르고 나니 잘 나오던 모유마저 나오지 않았다고 담담히 말하던 그녀였지만 딸이 아빠를 위해 만들었다는 어버이날 카드를 보여 주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늦은 밤 서울로 향하려는 기자에게 이제 여덟 살이 된 조 중사의 딸은 가는 길에 먹으라며 따뜻한 차를 챙겨 주었다. 그 순간 울컥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그들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과거에 썼던 제2연평해전서 숨진 6인의 용사에 대한 본보 시리즈를 다시 읽어 봤다. 기사를 읽고 나니 그들의 사연이 하나하나 떠올라 차마 영화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연평해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듯하다. 누군가는 이 영화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제2연평해전 용사들의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의 행적을 공격하는 ‘보수 영화’라고 비판하고, 누군가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유치한 영화라 평한다.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라 그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이 점은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 그들은 꼭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이며 이런 논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야만 한다.
뉴스룸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사설
구독
-

BreakFirst
구독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