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리더십 논란]
국무회의 활발한 정책토론 옛말… 朴대통령 작심발언 무대로 변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3차례의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정조준했다. ‘진실한 사람 선택’(11월 10일) ‘국회는 립서비스만 하는 위선 집단’(11월 24일) ‘국회는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12월 8일) 발언은 2주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6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한 곳도 국무회의다.국회가 오죽 답답했으면 대통령이 나섰겠느냐는 지적이지만 문제는 형식이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 상 기구이지 정치권을 ‘훈육’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어전(御前)회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청와대 회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오죽하면 ‘적자생존’(대통령 말씀을 잘 받아 적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이라는 말이 회자되겠느냐”며 “공개 석상은 말할 것도 없고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활발한 토론은 드물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도 “내각 구성원과 참모진의 면면을 보라”며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묵묵히 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은 4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기자회견은 지난해와 올해 딱 두 차례에 그쳤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첫 4년 동안의 기자회견이 78차례로, 월평균 1.6회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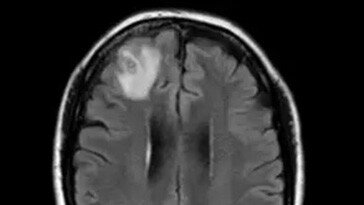
![“멀쩡해 보여서 샀는데” 당근서 산 아이폰 ‘수리비 폭탄’ [알쓸톡]](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67944.5.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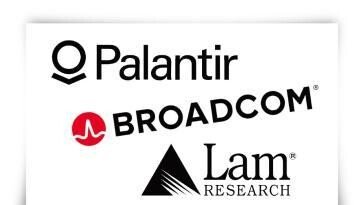
댓글 97
추천 많은 댓글
2015-12-17 08:54:30
대통령도 맨날 국민! 국민! 말로만 그러지말고 헌법규정대로 권한행사 해야한다 1)국회해산 및 헌법개정(안)발의! 2)국회를 스위스처럼 무보수화 하고 미국처럼 인구58만명당 1명해서 87명으로 축소! 4)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통합! 말보다 진실한행동
2015-12-17 11:45:03
어전회의라니 정말 짐승같은 놈들이다 말이 국회지 동물원보다도 못한 파렴치 동물들만 모인곳이 이 나라 국개다 국개해산하고 지방자치제도 해산하자 국가 발전에 걸림돌만 되는 놈들 세게에 부끄러운짖은 도맡아 하는 집단 뭘 할말있다고 대통령 운운하냐 못난 년놈들아 반성해라
2015-12-17 11:42:21
어이 기자 양반 말은 입밖에 나오면 주워 담지못한다,동아일보 뒤로 입사했나? 입버릇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