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나서 “집회, 시위를 엄단한다”는 발표를 하는 풍경이 어느덧 낯설지 않은 일이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불법’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정도로 집회·시위가 진행됐더라도 도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5년 12월 16일 세 차례 집회에서 도로점거 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모(45) 씨에게 일부 무죄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2년 5월 19일 서울광장 전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해 소공로 주변 차도를 점거하고, 같은 해 6월 16일과 10월 30일 열린 쌍용차 해고자 복직 시위 및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3개 집회 모두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집회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회전하는 차량 등이 이용하는 보조도로를 점거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역시 2012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장애인 관련 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광화문에서 안국역 교차로까지 진행된 행진이 교통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2심은 전 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하고 점거한 차로 외 다른 차로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 통행이 가능했더라도 이씨가 벌인 행진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며 1심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시위 과정에서는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가 종종 수반될 수밖에 없다. 참여 인원이 많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안 그래도 막히는 도심의 도로에서 시위에 따른 일부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00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합헌으로 판정했지만, 이 조항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권리 남용이며,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도심에서 벌어지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에서 교통을 저해하는 행위가 집회·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인지, 교통 저해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헌법 우선적 판단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법의 보수화는 이처럼 헌법상의 문제를 다시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와 법률이 보장하는 도로교통 가운데 과연 무엇이 먼저인가.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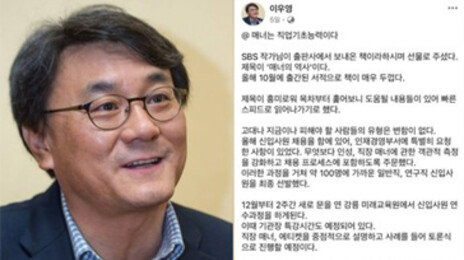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