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소는 중국에서 지원받는 원유와 식량, 그리고 금융이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를 이끌어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금융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끊도록 중국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다른 국가들도 냉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것은 한국을 크게 실망시키는 내용이다. “북핵 문제의 유래와 해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한 것도 중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이 4차 핵실험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6자회담 주최국을 맡은 이후 북한은 시간을 벌어가며 수소폭탄 운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중국이 6자회담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경사(傾斜)’라는 미일(美日)의 눈총을 받으며 중국과의 외교에 공을 들인 것도 이런 기류 변화와 중국 역할의 힘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행사 때 박 대통령이 톈안먼 망루에 올라선 것도 북핵 해결에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는 결단이었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을 움직여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전화해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핵 불장난’을 일삼는 북한이 중국의 번영은 물론 동북아 안정에 장애가 될 뿐임을 분명히 알리고, 김정은을 언제까지 감싸고 갈 것인지 물어야 한다. 시 주석은 후속 조치에 한중관계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준식의 한시 한 수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설]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9/130833493.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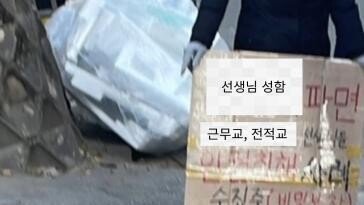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