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이, 부모가 거부땐 ‘격리’ 쉽지않아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고당해도 “가정문제”… 개입 힘들어
아동쉼터도 37곳 250명 수용 그쳐

19일 찾은 서울 강남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A 씨(33)는 “최근까지 수도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 정원의 2배에 가까운 아이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일손이 달려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는 얘기다.
경찰의 통보를 받고 학대아동 보호·치료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는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현재 55곳이다. 이곳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비밀리에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37곳을 운영하는데 정원이 각 7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수용인원이 약 250명밖에 안된다. 201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례가 1만 명이 넘고 14명이 사망했지만 학대 받는 아동이 갈 곳이 없는 셈이다.
경찰과 함께 학대피해 아동 조사와 치료 사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아동 보호의 중심이다.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방치하고 굶기고 때리는 식의 학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끔직한 일’이 빚어진다. 학대 초기에 발견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장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는 인원 및 시설적인 한계와 법적인 문제로 ‘격리’와 같은 대응을 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공조하는 경찰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자는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트렌드뉴스
-
1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3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4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5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6
뇌진탕 6세 아이 태운 차 마라톤 통제에 막혀…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
7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8
해수부 장관 후보에 임기택·황종우 압축…부산-관료 출신
-
9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
10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 사실무근…명예훼손 고발할 것”
-
1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2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5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6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10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트렌드뉴스
-
1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2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3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4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5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6
뇌진탕 6세 아이 태운 차 마라톤 통제에 막혀…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
7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8
해수부 장관 후보에 임기택·황종우 압축…부산-관료 출신
-
9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
10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 사실무근…명예훼손 고발할 것”
-
1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2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5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6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9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10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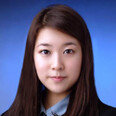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