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기업에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유해제품은 계속 팔려 국민건강 위협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제품에 치명적인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게 발견됐다면 즉시 판매금지가 가능할까?아니다. 판매금지나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까지는 보통 5개월이 걸린다. 현행법은 기업에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제품은 계속 시장에서 판매된다. 기업 논리에 국민 건강은 뒷전에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제품 성분검사와 화학성분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인 위해우려제품 15종, 총 8000여 개 제품 중에서 400개 정도 표본을 뽑아 검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후속조치다.
기업이 1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하면 또다시 성분 시험에 들어가는데,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역 환경청에서 기업의 조치계획서를 받는데 이 역시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실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기업에 통보하더라도 30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판매금지까지 총 5개월을 훌쩍 넘긴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나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나 똑같이 이런 절차를 밟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수십 개의 문제 제품을 적발하고도 소명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제품명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기업의 논리보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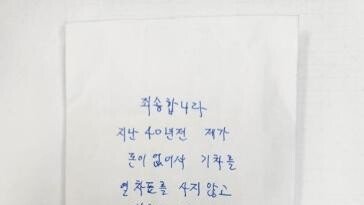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