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내각제인 핀란드에서 신임 총리는 법에 따라 10∼20년 미래를 내다본 국가전략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필레 총리는 일자리에 주목했다. 그는 연구원으로 출발해 정보기술(IT) 제품 개발 매니저를 거쳤고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바이오 에너지 관련 벤처기업을 창업해 큰돈을 벌었다. 그는 IT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등의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때 복지는 어떻게 작동할까. 노동을 기반으로 한 과세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복지와 산업안전 등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궁금증을 담아 2016년, 2018년 ‘일의 변환에 대한 해법’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토론, 자문을 거쳤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유지된다. 보고서는 20년에 걸쳐 평가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취급할 수 없다.
총리의 국회 카운터파트는 여야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미래위원회.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주 업무가 핀란드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연 보호, 바이오산업, 유전자 기술, 고령인구 등의 이슈를 챙기며 미래 전략을 마련한다. 4년마다 장기 보고서도 낸다. 2014년에는 ‘핀란드의 미래 기회 100가지’를 제시했다. 오픈데이터와 빅데이터,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조직, 증강현실 안경, 게이미피케이션, 양자 현상을 고려한 초고밀도 프로세서 개발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손이 있는 걸어 다니는 로봇, 로봇재단사 등도 거론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자일리톨 껌, 자살예방 프로젝트, 어린이 주간 돌봄 시스템 등과 함께 미래위원회를 핀란드의 10대 혁신으로 꼽았다.
핀란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처럼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핀란드는 러시아, 스웨덴 등 주변 강대국 때문에 안보 위기를 겪었고 최근에는 노키아 몰락의 후폭풍에 내몰렸다. 인구도 적으며 추운 지역이라 농사도 적합하지 않다. 1990년대 초반에도 경기 침체를 크게 겪었고 장기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는 1993년 임시 위원회 형태로 미래위원회를 만들었고 2000년 상설 조직으로 개편했다. 마리아 로헬라 청색개혁(정당) 의원(전 국회의장)은 “1996년 유럽연합 경제통화동맹(EMU)이 핀란드 경제에 끼칠 영향을 당시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해봤다. 20여 년 뒤 당시 전망을 살펴보니 일부(통화)는 맞았고 일부(경기 하강)는 예상조차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 예측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늘 새로운 것을 찾아야 생존하니 그만큼 미래 대비는 절박한 과제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정부는 2008년 5월 미래사회 전망과 사회통합, 소프트파워 등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을 짜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5년 뒤 폐지됐고 현 청와대에는 비서관급(1급) 이상에 ‘미래’라는 이름이 붙여진 자리는 없다. 다만 국회는 지난해 국회미래연구원을 세우고 미래 연구에 나섰다. 조선과 철강 등 성장엔진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렸지만 아직도 대표적인 신수종 산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미래 예측은 쉽지 않다. 하지만 눈을 가린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이유종 국제부 차장 pen@donga.com
글로벌 이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애널리스트의 마켓뷰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글로벌 이슈/서동일]어딘가 어설픈 폴란드의 베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1/28/9388294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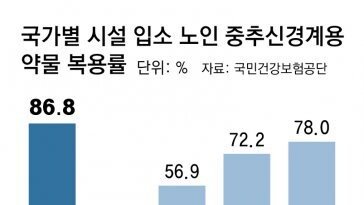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