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과 조찬 중에 서울에서만 도입된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로페이는 중간 결제 단계를 최소화해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그러고 보면 모든 좋은 제도는 일단 서울에서 시작된다. 조찬을 끝낸 뒤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꼭 제로페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울과 지방이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식물이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이익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이 갈수록 황량해짐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은 끝이 없다. 일단 쓸 만한 인재들은 지방에 남아있길 거부한다. 지방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고,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꿈꾼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 요즘에는 “서울에 아파트 사두었다가 돈벼락 맞았다”며 의기양양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상실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지역 격차는 일부 기업들의 ‘먹튀 현상’까지 초래했다. 지방 이전에 따른 혜택만 챙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도권으로 줄행랑을 치는 행태다. 그래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배부른 수도권 기업에 특혜를 얹어 주는 일’이라는 푸념마저 나온다. 서울과 지방의 현격한 격차가 지방을 살려 보려는 정책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피그말리온 효과’란 게 있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직원들에게, 스스로에게 긍정을 내면화하는 최면을 걸어 왔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인재와 자금,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방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최면의 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최면을 건다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하는 절박한 행위다.
이제라도 지방에서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방은 중앙의 변방이 아니라 ‘고향’처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곳이다.
신신자 장충동왕족발대표
기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기고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이주의 PICK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공학은 축제처럼, 혁신은 즐겁게[기고/민병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6/13051129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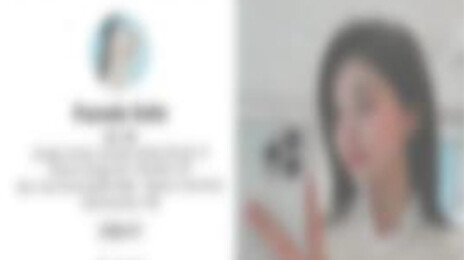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