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밤 ― 이기철(1943∼ )
봄밤
잊혀지지 않은 것들은 모두 슬픈 빛깔을 띠고 있다
숟가락으로 되질해온 생이 나이테 없어
이제 제 나이 헤는 것도 형벌인 세월
낫에 잘린 봄풀이 작년의 그루터기 위에
또 푸르게 돋는다
여기에 우리는 잠시 주소를 적어두려 왔다
어느 집인들 한 오라기 근심 없는 집이 있으랴
군불 때는 연기들은 한 가정의 고통을 태우며 타오르고
근심이 쌓여 추녀가 낮아지는 집들
여기에 우리는 한줌의 삶을 기탁하려 왔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행복의 모습은 하나이고, 불행의 모습은 여럿이니 행복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불행의 많은 경우들을 모두 제거해야만 가능하다. 전형적인 행복과 다양한 불행을 생각하다 보니 어쩐지 우리에게 행복은 이상이고 불행은 현실인 듯싶다.
그런데 시는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지도 않고 어느 쪽을 추구하지도 않는 아주 많은 시를 알고 있다. 인생을 담은 우리의 시들은 행복과 불행 그 사이쯤에 놓여 있다. 그런 시들은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둘 다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 예로 이기철 시인의 ‘봄밤’을 읽는다. 형벌 같은 세월을 사니 이 시인은 불행할까. 봄풀이 푸르게 돋으니 이 시인은 행복할까. 우리는 이 시에서 행과 불행의 글자를 잠시 지울 수 있다. 생은 행복을 잡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은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 한줌의 삶을 기탁하려, 주소를 잠시 적으려 왔을 뿐이라는 말에서 더 큰 삶의 의미가 느껴져 마음이 울컥한다.
과연 오늘 우리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 질문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해서 성공하고 불행해서 망친 것이 아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민애 문학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194〉14K](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9/05/11/954744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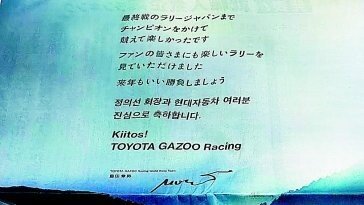

![베토벤 합창교향곡 200주년… 인류는 ‘환희’를 얻었을까[유윤종의 클래식感]](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0154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