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 장벽이 되고/프란시스코 칸투 지음·서경의 옮김/328쪽·1만5800원·서울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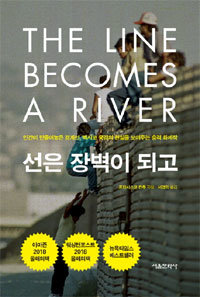
밀입국이 가장 기승을 부린 2000년에는 멕시코인 15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몰래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려다 체포되었다. 적발되지 않은 수는 훨씬 많다. 미국에는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 게다가 수많은 밀입국자가 범죄조직과 죽음의 계약을 맺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다.
저자는 멕시코 이민자 3세로 미국 쪽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성장했다. 국경 맞은편에 멕시코 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있다. 한반도 위성사진처럼 세계의 빛과 그림자가 갈리는 곳이다. 2010년 후아레스는 매일 8명이 피살되면서 ‘세계 살인 수도’로 낙인찍혔지만 같은 해 엘파소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순찰대의 눈에 뜨인 사람들은 대부분 짐을 내동댕이치고 황무지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그 경우 순찰대가 하는 일은 그들의 물을 땅에 쏟아버리고 음식을 뜯어 짓밟거나 불태우는 것이다. 물과 음식이 없이는 생명도 없는 것을 잘 알기에, 이들은 포기하고 근처 마을을 찾아 자수하기 마련이다.
하루는 죽은 삼촌의 시체 옆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던 열여섯, 열아홉 살 형제가 발견된다. 도로로 나가 종일 손을 흔들지만 아무도 차를 멈춰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길 위에 돌덩어리를 올려놓고, 결국 순찰대에 발견된다.
멕시코인에게 순찰대보다 힘든 존재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다. 이들에게 돈을 주면 국경을 넘을 때 망을 봐준다. 마리화나를 지고 국경을 넘으면 금액을 깎아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체포되면 영원히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카르텔에도 목숨을 위협받는다.
책에 ‘트럼프’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저자가 국경에서 각종 경험을 한 시기는 트럼프 등장 이전이다. 저자는 무엇을 호소하려 했을까. 입국을 원하는 멕시코인들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하다.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저자의 의도도 아니다. 그 대신 동유럽인의 2차 세계대전사를 연구한 역사가 티머시 스나이더의 말을 빌려 이 가엾은 이들에 대한 ‘존중’ ‘기억’을 호소한다. “하나하나의 죽음은 모두 고유한 삶을 의미한다. 희생자가 거대한 숫자의 일부분으로 인식되면 역사에 버림받는 것과 같다.”
워싱턴포스트와 아마존이 선정한 2018년 ‘올해의 책’이다. 원제는 ‘The line becomes a river’(선은 강이 되고).
유윤종 문화전문기자 gustav@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