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도 외교 실세가 대국민 소통… 정의용 실장의 깜깜이 외교 수술해야

2016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 내셔널프레스클럽. 워싱턴 주재 외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이 열렸다.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32세이던 2009년부터 8년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소년 외교책사’로 불리며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막후 조율했다.
거물이라 긴장했는데 로즈는 종종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전날 오바마의 연두교서 배경 등을 1시간가량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 외교를 움직이는 핵심 실세가 왜 굳이 이런 브리핑까지 하는 것일까. 옆에 있던 국무부 관계자가 서류에 적힌 직함을 보여주며 말했다.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보좌관(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이거든요. 외교정책을 대통령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게 벤의 역할이죠. 우리끼리만 알면 뭐 해요,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죠.”
이 장면이 떠오른 건 요즘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서 ‘정의용의 국가안보실’을 놓고 하도 말이 많아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의용 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권에서는 다른 문제를 거론한다.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하노이 이후 3월 잠시 간담회를 하더니 지난달 17일 리비아에서 납치된 주모 씨의 석방을 알리려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무대에서 사라졌다.
일각에선 안보실 업무 특성상 굳이 언론을 통해 소통해야 하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브리핑 횟수를 따지는 게 아니다. 이미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다른 조직에서도 안보실의 ‘닫힌 운영’이 임계점에 달했다고들 한다.
실제로 국민들은 외교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이 비핵화 협상이나 미중 갈등, 한일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 현안과 관련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소통 부재는 정부 다른 조직과의 불통으로도 이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실이 입 닫으면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낸 지 꽤 됐다”고 했다.
요즘 사방에서 한국 외교가 위기라고 한다. 국제정치에서 흔히 말하는 ‘해도(海圖)에 없는 바다(uncharted waters)’에 놓인 형국이다. 딱히 해법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없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부터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일의 순서다. 그러려면 ‘깜깜이 외교’를 주도한 국가안보실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외환위기도 현실을 외면한 채 눈 감고 귀 닫다가 벌어진 일이다. ‘외교 IMF 사태’는 피해야 한다.
이승헌 정치부장 ddr@donga.com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럴땐 이렇게!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오늘과 내일/이정은]北, 美대표 팔 붙잡던 절박함 남아 있다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5/130501572.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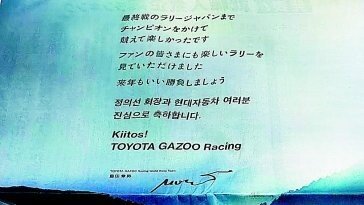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