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A가 몇 해 전 겪은 일이라며 해준 얘기다. 업무상 알고 지내던 한 국내 은행 임원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나 해왔다고 했다. 본인의 자녀가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데 학교에 제출할 에세이를 대신 써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한참 고민했지만 갑(甲)의 위치에 있는 그 임원의 요청을 끝내 거부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다. 당시 A가 일하던 회사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국내 금융계 인사들의 자녀가 유독 많이 채용돼 일했다. A는 “인턴 ○○는 □□은행장 딸, △△는 ××은행 부행장 아들이라는 식의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
금융계의 이런 갑질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금융회사 바클레이스가 국내 국책은행과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을 정직원 또는 인턴으로 뽑은 사실을 밝혀냈다. 자사를 외화채권 발행 주관사에 선정해 주는 대가로 채용 특혜를 준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채용비리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는 반칙 행위가 아직도 금융계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VIP 고객이나 유력 정치인의 채용 청탁이 개인 간의 부당거래라면 최근 기업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권력집단 간의 결탁이라는 점에서 더 진화된 형태다. 당초 노조는 신임 행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낙하산 반대’, ‘전문성 부족’이라는 고전적인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한 달 뒤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조가 행장의 출근을 ‘허락’하면서 호봉제 유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 자기 잇속을 잔뜩 챙겨가는 내용의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사실 이런 식의 은밀한 주고받기는 금융당국이 원조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감사 등으로 영입한 금융사는 당국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 이상 감소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얼마 전 만난 외국계 금융사 대표는 “글로벌 본사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국에서 자선사업을 하는 꼴”이라고 했다.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이네 뭐네 하지만, 투자한 자본 대비 거두는 이익 수준은 외국의 경쟁 회사 대비 바닥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리끼리야 뭐 대단한 실적이라도 되는 양 서로 자기 몫 챙기려 아옹다옹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한국의 은행들은 세상 흐름에 뒤처진 우물 안 개구리일 뿐이다. 꿀단지가 바닥을 드러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유재동 경제부 차장 jarrett@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담배 이제는 OUT!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광화문에서/신수정]한국에서 유난히 인색한 외국계 기업들의 사회 기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26/130511324.1.jpg)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511483.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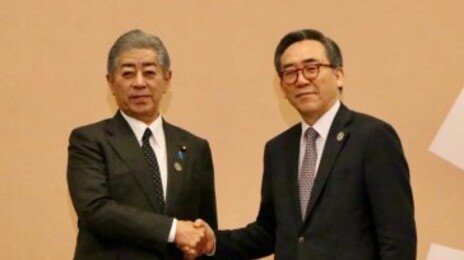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