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기고

“경로당 회원제를 막아주세요.”
재작년 이맘때쯤 어느 어르신이 보낸 민원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파트 단지 경로당을 쓰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새로 이사 온 분들의 경로당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공간이 좁다보니 벌어진 일이었다. 공공주택의 경로당은 어느새 회원제 클럽으로 변하고 있었다.
사안이 심각해 현장 몇 군데를 돌아봤다. 경로당 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단지 안에 ‘소주방’을 만들어 달라는 70대 어르신의 요청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다. 평생 여가를 보내는 방법을 몰랐던 분들로서는 음주가 유일한 낙이었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지 안 어린이놀이터에 빈 소주병이 뒹굴 수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22만여 채 중에는 다세대주택도 약 2만 채가 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의 요구사항 중 단연 첫째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이다. 천천히 들여다보면 왜 아파트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개별 주택을 놓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난방과 환기가 잘되고, 화장실이나 부엌 설비가 편하면 된다.
문제는 외부 편의시설이다. 경로당에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타야만 하고, 도서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이와 함께 즐길 놀이터를 찾아 옆 동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이에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위층으로 올리고 기존 공간은 도서실이나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 모임 장소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민 외에 동네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니 동네도 좋아진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우리는 커피숍 폐쇄를 경험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이 누구보다 힘들었을 게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커피를 좋아하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커피숍에 가면 사람을 만나거나 책을 보고, 인터넷을 하고, 음악을 듣는 게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다 공공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미국 뉴욕 맨해튼조차 걸어서 10∼15분이면 어김없이 공공도서관이 나타난다.
좋은 공간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준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경로당이 회원제 클럽처럼 운영되고 카공족이 양산되는 도시여서는 곤란하다. 오래전 윈스턴 처칠도 그랬다. ‘사람이 건물을 짓지만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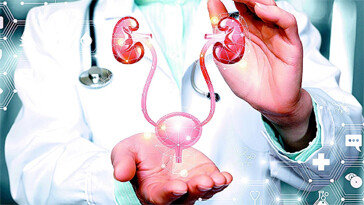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