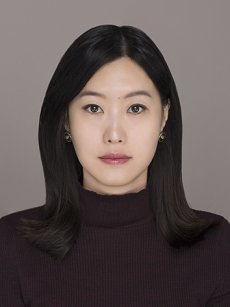
아직 특정 계파에 몸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A 의원은 요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게 두렵다. 대선후보 경선이 다가오면서 걸려오기 시작한 선배, 동료 의원들의 전화는 통상 “당연히 우리 쪽으로 와야지?”로 시작된다. 통화는 적잖은 압박과 고뇌로 이어진다. A 의원은 “총선보다 당내 선거가 더 어렵더라.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 때도 줄 한번 잘못 섰다가 문자폭탄을 받는 건 아닌지, 상임위원회 배치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는데, 대선판은 오죽하겠냐”고 했다.
오랜 ‘정치 짬밥’으로 여권 내 주요 대선주자들과 골고루 인연이 닿는 B 의원도 괴롭긴 마찬가지다. “업연을 택하자니 지역 민심이 걱정되고, 지연을 택하자니 개인적 인간관계가 마음에 걸린다”던 그는 고심 끝에 자신의 정치 멘토가 정해주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각자 1인 헌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조직 생활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한국 정치사에 계파 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지만 유독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는 진영별 줄 세우기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각자 만만치 않은 인물들 간 ‘3강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초반부터 후보 개인기나 비전보다는 세 과시 대결로 굳어가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이런 세력 결집이 결국 ‘내 밑으로 다 모이라’는 식의 두목놀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치 신인들일수록 앞으로 ‘주홍글씨’처럼 새겨질 낙인을 우려해 정치 철학이나 가치관보다는 지지율만 보고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최근 ‘빅3’ 후보들을 겨냥해 “세력 동원 경선은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 속 5·2전당대회를 치르는 내내 ‘친문’(친문재인), ‘비문’ 간 내홍을 겪었다. 물론 민주당은 “친문, 비문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또 언론 탓으로 돌렸지만, 솔직히 2017년 대선 경선 때 벌어진 집안싸움의 연장선상이란 걸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같은 ‘친이재명’ ‘친이낙연’ ‘친정세균’ 식 친소 관계에 따른 파벌 정치는 결국 언젠가 제2의 친문-비문 갈등으로 또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 세상 밖은 이미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반도체 등 차세대 산업을 둘러싼 패권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 정치판만 여전히 조선시대 당쟁 수준에 갇혀 있는 꼴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광화문에서/김상운]고구려-발해사 중국사라는 中 정부의 자가당착](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11/06/130378492.1.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