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누구나 쉽게 갖지 못하는 걸 쟁취했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일까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때에 느끼는 감정은 행복함 보다는 우월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이내 다른 사람들의 질투 어린 시선 속에 외로움으로 변하기도 하죠.
행복하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건 의외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보다 일상의 잔잔한 순간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비가 내린 뒤 물이 가득해 찰랑이는 호수에 햇볕이 내리쬐는 걸 바라볼 때, 밤새 펑펑 내려 무릎까지 쌓인 눈을 처음으로 밟을 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좋아하는 사람과 광화문광장에서 캔맥주 한 잔을 들이킬 때….
오늘은 19세기 인상파를 이끌었던 에두아르 마네가 그린 아름다운 삶의 한 순간에 관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주 두 잔을 손에 든 여자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맥주 두 잔을 손에 들고 있는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녀만 관객을 향해 얼굴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그녀가 들고 있는 맥주잔의 반짝이는 질감과, 앞치마와 소매의 흰 천을 칠한 거친 붓터치가 더욱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원래 그렸던 그림의 오른쪽 절반입니다. 작업을 하던 마네가 작품을 절반으로 뚝 잘라버리기로 결심한 건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수정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푸른 스모킹 양복을 입은 남성의 옷을 살펴볼까요. 오른쪽 부분에 직선처럼 색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마네가 그림을 그리다 이 부분을 캔버스를 덧대어 추가한 영역입니다.
즉 원래 작품에서는 맥주잔을 든 여자가 오른쪽 구석에 있었지만, 오른쪽 부분을 더하면서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마네는 파리의 한 카페 콩세르에서 ‘맥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여러 손님에게 재빠르게 술잔을 건네는’ 웨이트리스의 기술에 감탄하고 그녀를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 콩세르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에게 포즈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웨이트리스는 자신의 ‘보호자’가 함께 대동하고, 모델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의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해주었습니다. 그림 속 푸른 스모킹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 보호자였다고 합니다. 마네는 왜 맥주잔을 든 여자를 이렇게 크고 멋지게 그린 걸까요?
시간을 초월하는 몸짓
이 그림에서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맥주잔을 그린 여자를 그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마네가 오른쪽 캔버스 조각을 더하면서, 여자가 든 맥주잔은 하나에서 둘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시선을 따라 관객의 시선은 오른쪽으로 흐르고, 흰 앞치마를 따라 남자의 뒷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들고 있는 파이프 담배를 따라가면 무대로 시선이 흐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회색 모자를 쓴 남자, 머리 장식을 한 여자, 또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분주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여기에 무대 위 서 있는 무용수가 막 몸을 돌릴 것처럼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죠.

즉 웨이트리스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테이블에 맥주잔 하나를 놓으면서, 왼손에 놓인 두 개의 맥주잔을 어디에 놓을지 쳐다보고 있죠.
즐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일에 몰두한 모습입니다. 마네는 그러한 웨이트리스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그녀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러한 몸짓을 마치 스냅샷 사진을 찍은 것처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단순하게 말한다면, ‘인상파 회화가 순간을 포착하는 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상파 이전의 회화는 왕의 대관식,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신과 성인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진 것만 그렸고, 인상파는 이것에 반기를 든 것이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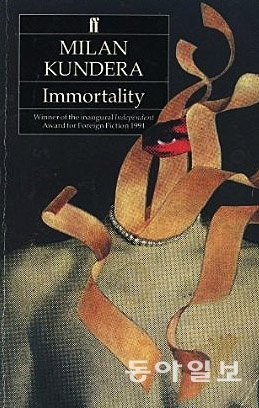
밀란 쿤데라의 소설 ‘불멸’에도 비슷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불멸은 작가가 우연히 본 60대 여성의 몸짓에서 시작합니다. ‘그 몸짓 덕택에,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매력의 정수가 촌각의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감동했다. 그 때 나의 뇌리에 아녜스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 독특한 몸짓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며 소설은 전개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구구절절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순간 뇌리에 강렬하게 박힌 이미지인가를 탐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불멸을 꿈꾸지만 언젠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히 남겨지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 함께했던 찰나의 기억들이라는 것.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미지라는 것.
마네는 그런 솔직하고 현실적인 인생의 순간들을 캔버스에 아름답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 마네의 작품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전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영감 한 스푼’은 예술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창의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계 전반의 소식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
영감 한 스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고흐가 슬픔에 잠겨도…그를 지켜준 사람들[영감 한 스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3/06/17/11981213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