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당선소감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크다. 나는 늘 기대를 저버리는 편이었다. 비록 운 좋게 내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시들이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시들이 있다. 심사위원분들의 날카로운 관점과 별도로 응모한 다른 분들의 모든 시 또한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는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두렵다.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써야 할 것이다.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늘 두려워하며 살 것이고, 또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아갈 것이다. 감사한 모든 분들….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은사님들과 심사위원분들을 호명해야겠으나,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 무섭다. 그러지 않으려면 결국은 시를 써야 할 것이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시를 쓰면서 살아갈 것이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시를 쓰는 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다. 재주 없는 인간인지라 오랫동안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좋은 일들이 올 수도, 또 나쁜 일이 올 수도 있겠지. 뭐 어떤가. 적어도 나는 그러려고 사는 것이다. 그러려고 쓰는 것이다. 딱 하나 욕심이 있다면 한 가지, 다시 한 번 시를 통해 독자분들과 만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시를 쓰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일상적인 장면을 사유와 이미지로 벼리는 솜씨 탁월
●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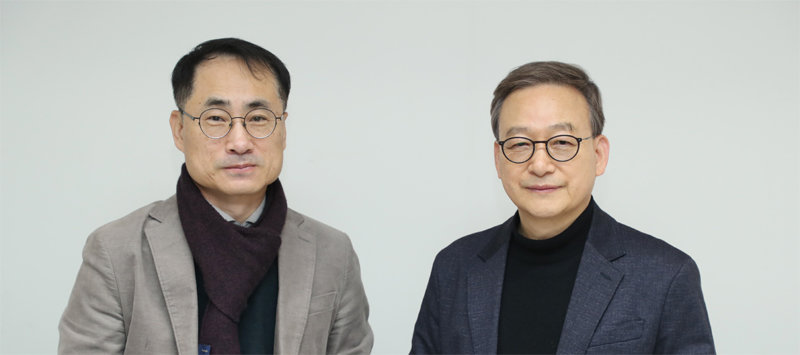
이런 난맥 가운데서도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논의한 작품은 네 편이었다. ‘그 이후’의 일부 문장들은 흥미롭게 읽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가 유기적으로 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컨베이어 벨트와 개’는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언뜻 발견하는 휴지와 파국을 실감 있게 그려냈지만 전체적으로 묘사에 치중한 소품으로 보인다. 최종 경쟁작 중 하나였던 ‘수몰’은 삶과 죽음, 시와 현실을 얽는 솜씨가 돋보였고 이미지 구사도 견실했지만 주제를 장악하는 사유의 힘이 아쉬웠다. 심사위원들이 ‘왼편’을 당선작으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장면을 사유와 이미지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문제적 현장으로 벼리어 내미는 솜씨 때문이었다. 이미지를 통해 핍진하게 전개되는 사려 깊은 성찰이 마지막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더욱이 투고된 다른 시편들도 편차가 적어 신뢰를 더한다. 당선자에게 축하와 격려의 악수를 건넨다.
정호승 시인·조강석 문학평론가(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4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전문은 동아신춘문예 홈페이지 (https://sinchoon.donga.com/)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