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현대미술가들의 전략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대한 세계관을 이어가고 있는 ‘스타워즈’. 첫 트릴로지의 마지막 편인 ‘제다이의 귀환’을 발표한 1983년, 조지 루커스 감독은 자기 집으로 79세의 학자를 초대해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그는 ‘20세기 최고의 신화 연구자’로 꼽힌 조지프 캠벨(1904∼1987)입니다. 루커스는 캠벨이 해석한 신화들 덕분에 ‘스타워즈’를 쓸 수 있었다며 캠벨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고전이 인간 본성에 관한 깊은 탐구와 시대를 뛰어넘는 공감으로 살아남는 것이라면, 신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고전 예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엔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눈길을 끈 두 국가관의 모습, 그 속에 드러난 신화의 끊임없는 생명력에 관해 소개합니다.
작은 폭포는 깊고 푸른 바다가 되어

전시장에 입장하면 부드러운 형광의 설치 조형물이 곳곳에 매달려 있고, 귀로는 리드미컬한 타악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나 현대적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는 말린 라벤더를 재료로 한, 향수와 약재 그 사이쯤에 있는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시는 카리브해 출신 흑인 최초로 프랑스관을 대표하게 된 예술가인 쥘리앵 크뢰제(38)의 개인전입니다. 크뢰제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 프랑스관 대표 작가가 되었는데, 이미 2021년 마르셀 뒤샹 프라이즈 후보에 오르며 프랑스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뢰제는 이번 전시에서 아프리카와 유럽, 과거와 미래, 자연과 도시 등 여러 상반되는 요소를 섞어 어딘가 익숙하지만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전시장 속 나무 조각은 어떤 면으로 보면 아프리카 목조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감각적인 마무리로 토속적 요소를 제거해 대도시 어딘가에 놓인 세련된 조각으로도 보이죠. 향과 음악이 내뿜는 이미지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각이 단순한 기교나 흥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신화와 사회에 관한 관심입니다. 크뢰제는 영상 작품에서 그리스 조각상이 뒤집힌 채 눈물을 흘리며 물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의 주제가 유럽 중심의 예술관에서 벗어나 보자고 제안한 것에 호응하는 대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전시장을 돌아보면 전체가 물속에 잠긴 듯 연출됐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물론이고 수많은 신화와 문화적 모티프를 흐르는 물속에 담그고 유연하게 보려는 목소리가 읽힙니다.
그녀의 신화와 춤을

회화 작품에서 바닥에 누운 여인이 소가 그려진 항아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레바논과도 연관이 있는 그리스 신화 속 ‘에우로페의 납치’를 작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알 솔은 이런 에우로페를 납치당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소의 머리를 갖고 노는 과감한 인물로 표현합니다. 그녀의 발에는 하트 모양이 그려진 깃발이 꽂혀 있고, 바닥에 편히 누워 관객을 응시하고 있죠. 영상 작품에서는 ‘멋진 소를 찾은 줄 알았더니 염소였네’라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가면 모양의 조각 작품은 신화 속에 등장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귀걸이로 플라스틱 줄자가 걸려 있거나 테이크아웃 커피잔, 바람개비 등 현대의 오브제들이 매달려 현재와 과거를 섞고 있습니다. 알 솔 역시 크뢰제처럼 유럽인들이 익숙한 신화에 기대면서 그것을 낯설게 만들며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현대 미술가들에게도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은,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입으로 전하며 다듬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결말이 있는 교훈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 탐욕, 좌절, 희망 등 여러 가지 단면을 수수께끼처럼 신화는 풀어내죠. 그 틈새를 파고들어 다르게 만들거나 비틀기를 하면서 예술가들은 자신만의 단단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감 한 스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e글e글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동아광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젊은 현대 미술가들의 전략, 신화의 힘[영감 한 스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4/06/13/12541809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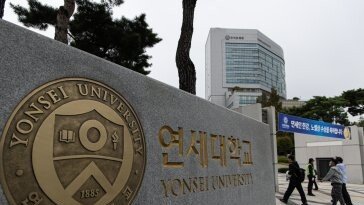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