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고수들의 움직임 치고 정치적 계산 없는 게 있으랴만 미-러 정상회담 무대로 선택된 슬로바키아도 계산의 산물로 보인다.
옛 소련의 위성국가였을 때나 1993년 체코와 분리된 뒤나 슬로바키아는 독재와 빈곤에 허덕이던 곳이었다. 변화는 7년 전 중도우파 집권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간섭과 규제, 기업 조세부담을 과감히 줄인 경제개혁 덕분에 지금은 ‘제2의 아일랜드’까지 바라본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는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프랑스와 독일엔 그들이 비판해온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보여줄 모범생으로 슬로바키아를 뽑은 모양이다.
이런 의도가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다. 배우가 너무 화려해 무대가 주목받지 못했다 싶다. 달라진 스타일, 똑같은 메시지로 요약되는 그의 유럽순방이 미국에 대한 점수를 높여준 것 같지도 않다. 부시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파워가 돼서 유럽의 첨단무기로 무장한 중국과 손잡는 건 못 본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對 EU 동상이몽▼
미국이 오만한 일방주의를 반성할 것으로 기대했던 착한 세계인들은 당연히 실망한 눈치다. 전쟁부터 환경까지, 세계관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미국과 유럽간의 화해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서양 양편을 한데 묶어온 서구라는 개념도 사라질 판이다. 힘과 무자비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미(美)제국주의 시대는 끝났으며 21세기는 휴머니티와 다양성, 합의를 중시하는 EU의 시대가 되리라는 ‘유럽의 꿈’이 ‘미국의 꿈’ 대안으로 나오는 조짐이다. 대서양 저쪽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우리에게 떡이 생길 리 없지만, 외교적 언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게 된 것만도 소득이 될 수 있다.
더 큰 소득은 슬로바키아의 상징성에서 나온다. 지난해 유럽을 돌아본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식과 유럽식 경제모델을 다르게 느낀다”며 우리가 너무 미국식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가 보여주듯, 이제 성장과 일자리는 유럽식 아닌 미국식 모델에서 나온다는 점을 놓치면 낙오되는 현실을 걱정해야 할 때다.
지난 3년간 미국경제가 5.5%, 영국이 6% 성장한 데 비해 유로존은 3%에 그칠 만큼 유럽경제는 암담하다. 경쟁을 경멸하는 척하면서도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겠다던 EU의 목표는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 일자리 없이는 삶의 질도 몽상일 뿐이다. 이달 초 유럽위원회(EC) 새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기업친화적 경제정책, 보다 솔직하게는 미국식 모델로의 획기적 변환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식 모델이란 말이 시대에 안 맞는다 해도 좋다. 이제는 ‘앵글로스피어(Anglosphere·영어권)’라는 주장이 뜨고 있다. 영어라는 공통어를 중심으로 개인주의, 법에 의한 지배, 신뢰와 개방 등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뭉치는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를 뜻한다.
▼성공의 꿈, 외면할 건가▼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처럼 쓰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광화국 등이 포함되지만, 이 신조어를 주제로 책을 쓴 제임스 베넷이란 팔방미인은 고맙게도 우리나라를 ‘앵글로스피어 주변국’이라며 문을 열어 놨다.
모델에도 유행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의 모델은 앵글로스피어가 될 수 있다.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뻔히 보면서도 유럽의 꿈이니, 동반성장이니, 아니 다 필요 없다며 무조건 우리식만 고집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뻔할 수밖에 없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동아광장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인터뷰
구독
-

이진영 칼럼
구독
-

사진기자의 사談진談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동아광장/이은주]국민의 뜻은 언제 드러나는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1/01/130771916.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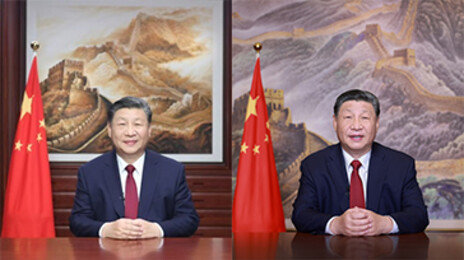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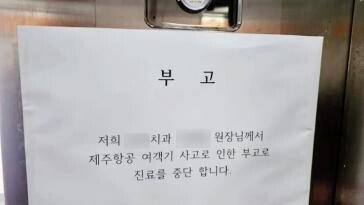
![[광화문에서/박훈상]정치 변방에 몰린 국민의힘… 민심의 중앙값을 찾을 때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71912.1.thum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