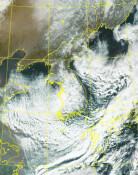우리나라는 절대빈곤에서 허덕이던 1960년대 초 서독으로부터 1억5000만마르크의 상업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런데 지급보증이 문제였다. 상업차관을 성사시키려면 은행의 지급보증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용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안이 간호사와 광원 파견이었다. 서독에 파견한 간호사와 광원 7000명의 임금을 담보로 코메르츠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줬던 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의 타고난 근면성 덕이 컸지만 독일인들의 대접은 따뜻했다. 순수이성비판을 읽는 대졸 학력의 한국 광원은 독일인들에게 경이로움 자체였다.
64년 12월 독일의 한 광산도시는 눈물바다였다. 독일 방문 중 위로차 들른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우리 간호사와 광원들은 서럽게 흐느꼈다. 대통령도 울고 대통령부인도 울었다. 이렇게 뿌린 눈물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이제 우리는 궂은일을 대신 해줄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처지가 바뀌어서일까.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숨진 한 중국인 근로자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보인다. 사장이 90만원만 주고 아직도 6만원을 안 준다. 말로는 며칠 후 준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은 다 이렇다. 일할 때는 빨리 하라고 하고 봉급 줄 때는 질질 끈다.
지난달 말 현재 1459명의 외국인근로자가 1인당 215만원씩, 31억3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5만원이면 중국이나 아시아 빈국()의 근로자가 현지에서 1년반 이상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다. 물론 경영사정이 나쁘다보면 한두 달치 임금이 밀릴 수는 있다. 문제는 체류기간이 4년을 넘어 자진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있다는 것이다.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속담이 달리 쓰일까.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이 7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제도는 세계무대에 내놔도 별 손색이 없다. 외국인근로자를 가족처럼 대해 주는 사업주들도 많다. 몇몇 악덕사업주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내친 김에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단의지를 보여야 한다. 일자리가 있는 한 불법체류자는 숨어서라도 남아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권침해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천 광 암 논설위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