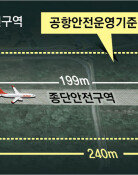국가인원위원회는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밝힌 양천경찰서의 고문의혹은 의혹은 시간대, 장소, 가혹행위 방법 면에서 구체적이다. 인권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양천경찰서에서 기소된 32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이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맞고 수갑을 찬 팔이 꺾이는 속칭 날개꺾기 등 엇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에 진술을 한 피의자 중 한명은 마약을 하다 붙잡힌 전과 16범이며, 체포 전 자기들끼리 싸우다 찢긴 이마의 상처를 병원에 데려가 꿰매줬더니 경찰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실제 수사관들이 마약이나 조직폭력 사범 등을 검거할 때 칼이나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의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수사관의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지능적 피의자도 없지 않다. 범인검거 과정에서 저항하는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한 때도 있다.
하지만 이미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진정인 이모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월28일 강력팀 사무실 조사현장을 담았어야 할 CCTV 각도가 애초 위로 틀어져 있는데다, 경찰의 하드디스크엔 3월9일부터 4월2일까지 CCTV 녹화분이 들어있지도 않았다. 고의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문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공권력 범죄다. 아무리 악질피의자라도 고문수사가 허용돼선 안 된다. 강박에 의한 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일 때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도 자백의 자유의사(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5공화국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권인숙 성고문 사건 등 고문의 야만성에 몸서리를 쳤던 기억이 아직 선연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문 범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은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관 5명을 어제 소환조사했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가혹행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경관들을 모두 재판에 회부하고 지휘책임이 있는 상부선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