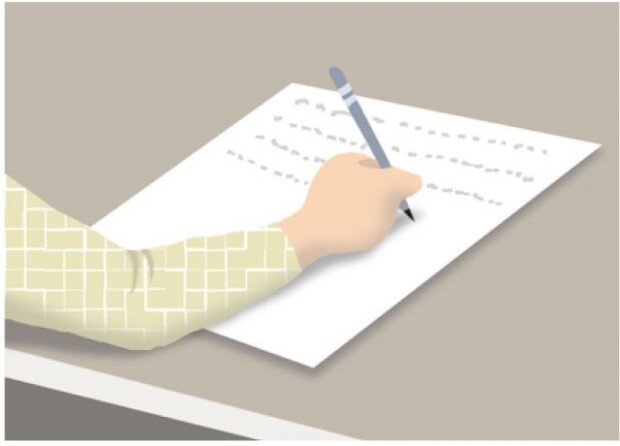

우리는 작가가 된다.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은 채,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쓰면서.
―아고타 크리스토프, ‘문맹’ 중
언어와 사고는 유기적이다. 말하는 방식이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은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스물한 살에 프랑스로 떠나 18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느낀 것이다. 외국어를 쓰는 나는 한국어를 쓰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
나의 말과 생각을 지배했던 외국어, 나는 그것을 모어(母語) 바깥의 언어라 부른다. 그 언어는 모어와 충돌하며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할 수 있는 말만을 골라 쓰게 한다. 나는 그 언어로 인해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바깥사람이 됐다.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헝가리 혁명의 여파로 모국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했고, 뇌샤텔의 시계 공장에서 일하면서 프랑스어를 배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글을 쓴 작가다. 역사와 개인의 불행, 그것을 뛰어넘은 한 인간의 거대한 생과 업적을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고민 없이 적는 것. 이 자연스러운 언어가 때로는 야만적이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라는 말 이전에 붙었던 조건과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에는 빈 종이에 더듬더듬 한 줄씩 채워 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 가난한 언어 앞에 말의 욕망이 무릎 꿇는 시간, 말의 본질을 위해 치장을 벗는 시간. 믿음에는 간절한 문맹의 시간이 있다. 크리스토프와 그의 작품은 내게 꿈이 아닌 믿음이다. ‘쓰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고집스럽고 끈질기게 쓴다’라는 작가의 말을 믿는다. 다시, 나의 바깥 언어를 떠올리며 나의 믿음을 적는다. ‘쓴다.’ 이 믿음에는 과거형도 미래형도 필요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