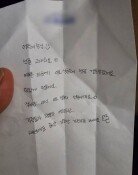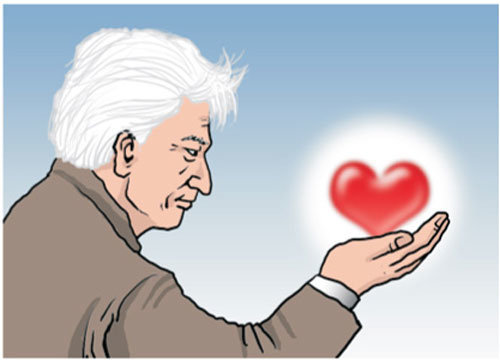
증오에서 증오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다.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증오에서 사랑의 윤리를 캐낸 사람이었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초등학교에서는 일등을 하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국기를 게양했다. 그런데 데리다의 차례가 됐을 때 다른 학생이 그 일을 대신했다. 그가 유대인이어서 그랬다. 그 일만이 아니었다. 식민정부는 유대인 학생들을 제한하기 위한 할당제를 실시했다.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반으로 줄였다. 그의 표현대로 “검고 매우 아랍인 같고 키 작은 유대인”이었던 그가 1942년 10월에 중학교에서 쫓겨난 이유다. 이듬해 4월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으니 불과 몇 개월이었지만 그 일은 열두 살짜리 소년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가 철학자가 되어 말하고 쓴 모든 것에 그 상처가 남았다. 조금 과장하면 그 상처가 철학의 출발점이었다. 상처는 그에게 증오에 대한 맞대응을 가르치지 않았다. 원한이나 열등감을 가르치지도 않았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것이 가르친 것은 타자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었다. 그가 진정한 환대는 환대할 수 없는 것을 환대하는 것이라면서,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환대하자고 얘기한 것도 그 상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대인인 그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분개한 것도 그래서였다. 그는 역사적으로 수난을 당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수난으로 몰아넣는 모순과 위선을 싫어했다.
그는 상처를 윤리학의 초석으로 삼은 따뜻한, 정말이지 따뜻한 철학자였다. 오죽하면 모든 사유가 그 상처에서 연유한다고까지 말했을까. 그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상처에 약을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굳이 나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치유는 치유의 거부에 있었다. 그릇이 큰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문학평론가·전북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