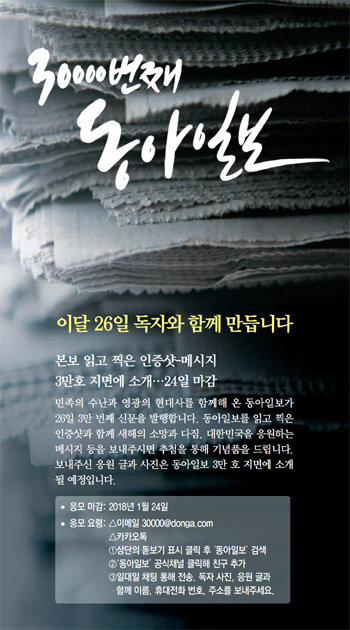
경기 광명시의 광명업사이클센터(센터장 강진숙) 직원들이 지령 3만 호(1월 26일)를 맞는 동아일보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보내 왔다. 버려진 물건에 예술성을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업사이클’이란 이름에 걸맞게 읽고 난 동아일보 지면을 활용한 가방을 찍은 인증샷(사진 1)을 보내온 것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신문으로 공부하는 청소년들, 손자와 함께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 동아일보 홍보역을 자처하는 택시운전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자들이 카카오톡과 이메일(30000@donga.com)로 동아일보 관련 사진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왔다.


‘직장인 3년 차’ 장대진 씨는 취업 성공 비결로 동아일보를 꼽았다. 대학에 입학하며 동아일보를 구독하기 시작했다는 장 씨는 “대학생이 되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잦아졌고 대화 소재가 필요해 신문을 찾게 됐다”며 “어느 직종에 가든 글을 쓰고 설득할 일이 많다. 신문이 좋은 교재임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김창열 씨(76)는 매일 저녁식사를 마친 뒤 경기 용인서원초 1학년인 외손자 민시후 군을 부른다. 무릎에 앉히고 동아일보를 함께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김 씨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한 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동아일보를 구독했다. 동아일보 정기 구독자가 된 지 약 60년. 그는 “동아일보는 날 선 비판 정신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정의로운 언론이 돼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씨의 둘째 딸 주미 씨는 아버지와 아들의 신문 읽는 모습을 담은 ‘인증샷’을 보내며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시후에게 계속 동아일보를 읽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지영 kimjy@donga.com·김아연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웹툰뉴스]독자의 사랑으로 이어온 100년, 동아일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3/26/89295959.3.jpg)
![美도 홀린 K뷰티… 프랑스 제치고 美 수입시장 첫 1위[횡설수설/김재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80856.1.thumb.jpg)


댓글 0